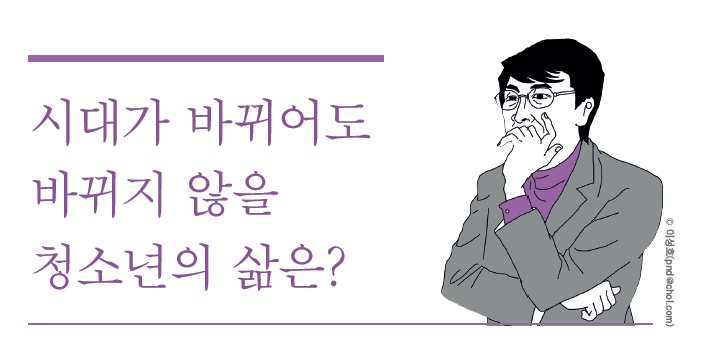앞잡이 길잡이 [작가/저자] [나와 청소년문학]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청소년의 삶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박상률 소설가
필자가 청소년소설 『봄바람』을 펴낸 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회고조’라는 말이다. 『봄바람』에 들어 있는 이야기가 작가의 어린 시절을 회고한 것이라는 뜻이다. 본격적인 평론은 하지 않고 그저 “1960년대 작가의 어린 시절 회고조인 이야기”로 어쩌고저쩌고하는 인상 비평 내지 감상평만 들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이 쓰는 말로 ‘그래서 어쨌다고?’를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작가는 오로지 작품으로만 말하는 사람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정치가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존재감을 알리는 사람이듯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일을 다룬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때로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시점에서 기억이 바뀌기도 한다. 게다가 작가의 주장이나 판단 같은 것을 담기도 한다. 이야기를 전해 주는 서사적 기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다. 소설은 그래서 과거형으로 쓴다. 연극이나 영화는 아무리 오래 전 일일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쓴다. 그렇기에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현재형을 쓴다.
물론 소설을 과거형으로 쓴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주장이나 판단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럴 뿐이다. 말하자면 작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잘하기 위해 묘사를 과거형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이야기에 들어 있는 작가의 주장이나 판단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똑같다.
편의상 갑순이와 갑돌이가 있다고 하자. 갑순이와 갑돌이는 ‘우연히’ 재 너머 고갯길 너머에 있는 밭으로 일하러 간다. 두 사람은 그냥 같은 시각에 고개를 넘어갔을 뿐이다. 이것을 ‘우연히’ 본 을순이가 저녁 때 우물가에서 이런 말을 했다. “갑순이와 갑돌이가 보리밭에 가서 놀았어!” 갑순이와 갑돌이는 함께 보리밭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을순이의 판단이나 주장에 따라 같이 보리밭에 가서 논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을 들은 병순이는 아예 한술 더 뜬다. 병순이가 정순이에게 이 말을 전해 주면서 “을순이한테서 들은 이야기야.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까 너만 알고 있어. 갑돌이와 갑순이가 보리밭에서 뒹구는 것을 을순이가 보았대. 보리밭이 다 뭉개졌다는구먼. 근데 얼마전에 둘이 읍내 산부인과에 다녀오는 것 같더라구….” 병순이가 한 이 말을 들은 정순이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애를 낳아서 건넛마을 애 못 낳는 최 씨 부부에게 주었대. 최 씨 부부의 아기가 사실은 갑순이와 갑돌이가 낳은 아이래!”
이야기는 사람을 건너갈 때마다 덧붙여지고 비틀어진다. 여기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곧 작가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기본 이야기에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을 덧붙인다. 이야기를 더 얹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된다. 때론 사실이 왜곡될 만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현대에 들어와선 전형적인 소설의 방식이 되었다. 이야기를 잘 들려주기 위해 과거형으로 묘사를 하던 버릇이 소설 문법으로 굳은 것이다.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하면 서사성이 높아진다. 그 서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일단 놔두고라도. 그러고 보니 필자가 예로 든 것도 옛날에 늘 있던 시골 풍경이네! 이러니 ‘회고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그런데 사는 방식이나 환경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비슷하게 펼쳐지는 사례는 많다. 단지 필자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드는 게 가장 쉬우므로 옛날 사례가 튀어나온 것이지, 보편성이 없는 게 아니다. 보편성이 있으면 예로 든 게 옛날 일이든 지금 일이든 상관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조선 시대든, 현재든, 미래의 어느 때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들이라면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다. 다른 시대 청소년들이지만 똑같이 통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보편성이다. 시대가 어떻든 청소년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시대의 고금을 따질 필요 없이 청소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일 것이다. 그 나이 대에는 생리작용이 활발하여 때의 고금,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왕성하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노골적인 관심이든, 관심이 없는 척 위장을 하든 그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은 하여튼 ‘내 마음 나도 몰라!’이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 다음으로는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 주어도 어딘가에 자기가 그리는 이상향이 있을 것만 같다. 그런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 기회만 되면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 이른바 가출이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 가운데 영악한 이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여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며 절대로 집을 안 나가려 한다. 이런 심리를 반영하여 어떤 광고에선 노골적인 ‘광고 문구’로 써먹기도 했다. 가출 심리가 안정되어, 현실을 인정하고 차분히 지내면 어른들은 곧잘 ‘철들었다고’ 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인 줄 너무 잘 아는 아이들. 현실을 일찌감치 인정하는 아이들 모두 사실은 ‘길들여진’ 탓이다. 철이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은 미래가 불안하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뭘 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 마련이다. 신분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도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아이들의 고민이다. 조선시대에 양반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과거를 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과거를 통과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기 아이들은 ‘공자 왈 맹자 왈’이 따분하기만 했다.
‘춘향전’의 몽룡이 같은 인물을 보자.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보다는 연애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몽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춘향이를 구하는 어사가 된다. 미래를 위해선 과거에 급제해야 하고,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연애이다. 춘향전은 그 시대의 아이들 모습을 잘 반영했다. 공부 안 하고도 과거에 급제하고 사랑하는 이성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청소년소설 『봄바람』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심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청소년소설은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야 한다. 이른바 ‘사건화’를 하는 것이다.
『봄바람』에서 훈필이의 은주에 대한 관심과 서울아이에 대한 관심 모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삼각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통속소설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에 나는 청소년들의 집 떠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반영하여 훈필이로 하여금 가출을 하게 하였다. 비록 그 가출은 실패로 끝났지만….
훈필이가 가출을 결심하는 데는 염소의 죽음도 한몫했다. 어떤 염소인가? 훈필이가 상급학교 진학 시 학비가 되어 주어야 하는 염소이다. 그런데 그런 염소가 죽고 말았다. 훈필이로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훈필이가 생각하기에 은주는 옛날 은주가 아닌 것 같고 서울아이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거기에 염소까지 죽었으니 앞날이 캄캄하다. 그러니 더욱 집을 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훈필이가 가출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훈필이 아버지는 “성공해서 왔냐?”라고만 묻는다. 훈필이가 집을 나갈 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써 두고 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자식을 키워 본 나도 훈필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위선자인가? 내가 현실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꽤나 큰소리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그렸다. 이건 내가 위선자이어서가 아니라 훈필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내 무의식의 발로 아니었을까? 하여간 그건 그렇고, 옛날 아이든 지금 아이든 미래 어느 시대 아이이든 『봄바람』에 담긴 이야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삶의 밑바탕을 이루는 환경은 변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회고조’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
걸핏하면 청소년소설에선 당대 아이들의 현실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대의 현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보편성 있는’ 현실도 중요하다. 나는 『봄바람』에서 그런 보편성을 그렸다. 그런데 시대 배경이 1960년대라고 해서 단순히 회고조라고만 하면 작가의 의도를 잘 살피지 못한 독법이다. 물론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살피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식으로 읽고 판단한다. 작가의 이런 해명이 사실은 불필요하다.
소설이 지나간 것을 과거형으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사성을 높이기 위한 까닭이 크다. 서사성을 높이려면 지나간 일을 차분히 돌아보고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게 사건을 그려야 한다.
이에 반해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선 작가가 느낌을 밝히거나 판단을 하거나 주장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옛일이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그린다. 희곡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까닭은 서사성보다는 묘사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연극 관객이나 영화 관객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한다. 느낌이나 판단은 사건을 보고 난 관객의 몫이다. 물론 작가의 의중이 실리게 사건을 그릴 수는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처럼 노골적으로 작가가 주장하지 않는다. 관객들은 오로지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서만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일을 다룬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때로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시점에서 기억이 바뀌기도 한다. 게다가 작가의 주장이나 판단 같은 것을 담기도 한다. 이야기를 전해 주는 서사적 기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다. 소설은 그래서 과거형으로 쓴다. 연극이나 영화는 아무리 오래 전 일일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쓴다. 그렇기에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현재형을 쓴다.
물론 소설을 과거형으로 쓴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주장이나 판단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럴 뿐이다. 말하자면 작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잘하기 위해 묘사를 과거형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이야기에 들어 있는 작가의 주장이나 판단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똑같다.
편의상 갑순이와 갑돌이가 있다고 하자. 갑순이와 갑돌이는 ‘우연히’ 재 너머 고갯길 너머에 있는 밭으로 일하러 간다. 두 사람은 그냥 같은 시각에 고개를 넘어갔을 뿐이다. 이것을 ‘우연히’ 본 을순이가 저녁 때 우물가에서 이런 말을 했다. “갑순이와 갑돌이가 보리밭에 가서 놀았어!” 갑순이와 갑돌이는 함께 보리밭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을순이의 판단이나 주장에 따라 같이 보리밭에 가서 논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을 들은 병순이는 아예 한술 더 뜬다. 병순이가 정순이에게 이 말을 전해 주면서 “을순이한테서 들은 이야기야.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까 너만 알고 있어. 갑돌이와 갑순이가 보리밭에서 뒹구는 것을 을순이가 보았대. 보리밭이 다 뭉개졌다는구먼. 근데 얼마전에 둘이 읍내 산부인과에 다녀오는 것 같더라구….” 병순이가 한 이 말을 들은 정순이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애를 낳아서 건넛마을 애 못 낳는 최 씨 부부에게 주었대. 최 씨 부부의 아기가 사실은 갑순이와 갑돌이가 낳은 아이래!”
이야기는 사람을 건너갈 때마다 덧붙여지고 비틀어진다. 여기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곧 작가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기본 이야기에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을 덧붙인다. 이야기를 더 얹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된다. 때론 사실이 왜곡될 만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현대에 들어와선 전형적인 소설의 방식이 되었다. 이야기를 잘 들려주기 위해 과거형으로 묘사를 하던 버릇이 소설 문법으로 굳은 것이다.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하면 서사성이 높아진다. 그 서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일단 놔두고라도. 그러고 보니 필자가 예로 든 것도 옛날에 늘 있던 시골 풍경이네! 이러니 ‘회고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그런데 사는 방식이나 환경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비슷하게 펼쳐지는 사례는 많다. 단지 필자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드는 게 가장 쉬우므로 옛날 사례가 튀어나온 것이지, 보편성이 없는 게 아니다. 보편성이 있으면 예로 든 게 옛날 일이든 지금 일이든 상관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조선 시대든, 현재든, 미래의 어느 때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들이라면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다. 다른 시대 청소년들이지만 똑같이 통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보편성이다. 시대가 어떻든 청소년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시대의 고금을 따질 필요 없이 청소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일 것이다. 그 나이 대에는 생리작용이 활발하여 때의 고금,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왕성하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노골적인 관심이든, 관심이 없는 척 위장을 하든 그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은 하여튼 ‘내 마음 나도 몰라!’이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 다음으로는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 주어도 어딘가에 자기가 그리는 이상향이 있을 것만 같다. 그런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 기회만 되면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 이른바 가출이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 가운데 영악한 이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여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며 절대로 집을 안 나가려 한다. 이런 심리를 반영하여 어떤 광고에선 노골적인 ‘광고 문구’로 써먹기도 했다. 가출 심리가 안정되어, 현실을 인정하고 차분히 지내면 어른들은 곧잘 ‘철들었다고’ 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인 줄 너무 잘 아는 아이들. 현실을 일찌감치 인정하는 아이들 모두 사실은 ‘길들여진’ 탓이다. 철이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은 미래가 불안하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뭘 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 마련이다. 신분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도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아이들의 고민이다. 조선시대에 양반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과거를 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과거를 통과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기 아이들은 ‘공자 왈 맹자 왈’이 따분하기만 했다.
‘춘향전’의 몽룡이 같은 인물을 보자.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보다는 연애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몽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춘향이를 구하는 어사가 된다. 미래를 위해선 과거에 급제해야 하고,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연애이다. 춘향전은 그 시대의 아이들 모습을 잘 반영했다. 공부 안 하고도 과거에 급제하고 사랑하는 이성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청소년소설 『봄바람』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심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청소년소설은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야 한다. 이른바 ‘사건화’를 하는 것이다.
『봄바람』에서 훈필이의 은주에 대한 관심과 서울아이에 대한 관심 모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삼각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통속소설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에 나는 청소년들의 집 떠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반영하여 훈필이로 하여금 가출을 하게 하였다. 비록 그 가출은 실패로 끝났지만….
훈필이가 가출을 결심하는 데는 염소의 죽음도 한몫했다. 어떤 염소인가? 훈필이가 상급학교 진학 시 학비가 되어 주어야 하는 염소이다. 그런데 그런 염소가 죽고 말았다. 훈필이로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훈필이가 생각하기에 은주는 옛날 은주가 아닌 것 같고 서울아이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거기에 염소까지 죽었으니 앞날이 캄캄하다. 그러니 더욱 집을 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훈필이가 가출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훈필이 아버지는 “성공해서 왔냐?”라고만 묻는다. 훈필이가 집을 나갈 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써 두고 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자식을 키워 본 나도 훈필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위선자인가? 내가 현실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꽤나 큰소리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그렸다. 이건 내가 위선자이어서가 아니라 훈필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내 무의식의 발로 아니었을까? 하여간 그건 그렇고, 옛날 아이든 지금 아이든 미래 어느 시대 아이이든 『봄바람』에 담긴 이야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삶의 밑바탕을 이루는 환경은 변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회고조’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
걸핏하면 청소년소설에선 당대 아이들의 현실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대의 현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보편성 있는’ 현실도 중요하다. 나는 『봄바람』에서 그런 보편성을 그렸다. 그런데 시대 배경이 1960년대라고 해서 단순히 회고조라고만 하면 작가의 의도를 잘 살피지 못한 독법이다. 물론 독자는 작가의 의도를 살피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식으로 읽고 판단한다. 작가의 이런 해명이 사실은 불필요하다.
소설이 지나간 것을 과거형으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사성을 높이기 위한 까닭이 크다. 서사성을 높이려면 지나간 일을 차분히 돌아보고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게 사건을 그려야 한다.
이에 반해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선 작가가 느낌을 밝히거나 판단을 하거나 주장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옛일이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그린다. 희곡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까닭은 서사성보다는 묘사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연극 관객이나 영화 관객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한다. 느낌이나 판단은 사건을 보고 난 관객의 몫이다. 물론 작가의 의중이 실리게 사건을 그릴 수는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처럼 노골적으로 작가가 주장하지 않는다. 관객들은 오로지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서만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