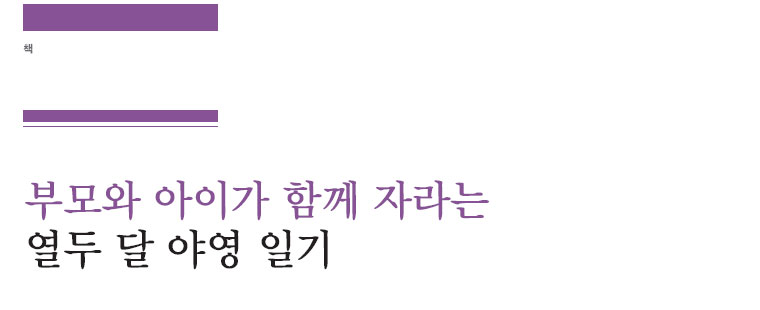여럿이 함께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열두 달 야영 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장동석 북칼럼니스트
캠핑이 대세다. 불편한 것 싫어하고, 장비라고는 달랑 텐트와 의자뿐인 우리 집도 다른 친구 가정의 도움을 받아 벌써 두어 번 캠핑을 다녀왔으니 말이다. 텐트를 치고, 물 길어 밥하고, 기타 등등 과정이 귀찮기는 하지만, 일단 두 아들은 좋아한다. 도시의 아스팔트에 갇혀 살던 아이들은 냇가에서 송사리를 잡고, 산자락을 뛰며 자유를 만끽한다. 자주 다니자고 약속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바람과 별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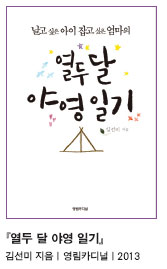
『열두 달 야영일기』는 “한 달에 한 번 자연 속에 작은 집을 새로 짓자, 이왕이면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자”는 취지로 한 가족이 캠핑에 나선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강한 바람’ 엄마와 ‘빛나는 별’ 아빠가 자연을 깊이 만나기 위해 펼친 공간의 이름은 ‘바람과 별의 집’이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의 보금자리가 된 텐트 ‘바람과 별의 집’은 “어디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펴고 접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한 손으로 거뜬히 들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집 그리고 여행 가방 속에 넣고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집”인 작은 텐트는 “전국 어느 곳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집 정원으로 만들”어 주었다. 작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다달이 그런 집을 만들었다. 그렇게 봄을 맞고 여름을 즐기고 가을을 기다렸고 겨울을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도 아이들은 자랐다. 내게는 철 따라 변하는 것과 계절이 수도 없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캠핑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하다. 각자의 방이 생기면서 “가족 모두가 살을 맞대고 눕는 정겨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처음 텐트를 친 곳이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격포 캠핑장이다. 첫 캠핑은 쉽지 않았다. 바다를 만난 기쁨은 잠시였고 이내 어둠이 몰려 왔다. 반대로 건너편 모텔의 불빛은 불야성이었다. “우리도 저런 데 가서 자면 좋겠다.” “너무 추워.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싶은데…” 등 딸들의 푸념이 터져 나왔지만 카드놀이 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아직 봄이 당도하지 않은, 쌀쌀한 바닷가에서의 캠핑이었지만 가족의 온기가 전해진 텐트 안 잠자리는 따뜻했다. 첫 캠핑을 마치고 남편이 “이게 우리식의 대안학교라 생각하자!”고 말했단다. 책을 쓴 아내는 속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 좋은 학교를 찾아 이사하는 대신, 우리는 담장도 교실도 없는 자연 속 학교로 자주 떠나련다.”
한 번 발을 들이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뭐든 쉬운 법이다. 두 번째 캠핑은 경칩과 춘분 즈음에 떠난 섬진강이었다. 여전히 푸념이 심했지만, 두 딸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큰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헤드폰을 쓰고 음악에 취해 걷는 게 마냥 좋은 모양”이었고, 둘째는 “카메라를 들고서 멋진 풍경 속에 모델이 되어달라고” 엄마와 아빠를 불러 세웠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난 자연, 그 속에 터 잡고 신비를 뿜어내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가족은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캠핑, 열린 배움의 공간
여름이 시작될 무렵, 입하와 소만 즈음에 떠난 경북 청송에 있는 주왕산 캠핑장에는 친구 가족을 초대했다.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딸만 둘이라 아이들끼리도 친했다. 걱정이 없지 않았다. 캠핑이 처음인 친구네 가족이 “하룻밤 노숙을 하고 나면 ‘괜히 따라왔다’고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새벽녘에는 비까지 내렸다. 하지만 친구는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 비도 오는데 게으름 좀 피우지 뭐”라며 여유로웠다. 그나마 캠핑 선배라고 두 딸도 제 몫을 하며 부모를 거들었다. “그렇게 여름이 오고, 아이들도 여물어간다.”
입추와 처서 즈음인 8월 캠핑에는 바다를 건넜다. 해외는 아니고 울릉도였다. 남편의 여름휴가에 맞춰 평소보다 멀리, 길게 떠날 곳을 물색하다가 울릉도로 낙점한 것이다. LPG 충전소가 없어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당연히 짐을 줄여야 했다. 그래도 두 딸은 “휴가가 아니라 무슨 극기훈련 떠나는 것 같다”며 투덜거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원래 캠핑이 변수가 많지만, 처음 가보는 곳이니 더더욱 그랬다.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해수욕은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면 좋은 구경거리가 있고, 어디에 텐트를 치면 안성맞춤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띔해 주었다. 오기 전에 세세히 준비했지만, 살면서 경험한 사람들이 말이 더 귀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입하와 소만 즈음에 떠난 경북 청송에 있는 주왕산 캠핑장에는 친구 가족을 초대했다.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딸만 둘이라 아이들끼리도 친했다. 걱정이 없지 않았다. 캠핑이 처음인 친구네 가족이 “하룻밤 노숙을 하고 나면 ‘괜히 따라왔다’고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새벽녘에는 비까지 내렸다. 하지만 친구는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 비도 오는데 게으름 좀 피우지 뭐”라며 여유로웠다. 그나마 캠핑 선배라고 두 딸도 제 몫을 하며 부모를 거들었다. “그렇게 여름이 오고, 아이들도 여물어간다.”
입추와 처서 즈음인 8월 캠핑에는 바다를 건넜다. 해외는 아니고 울릉도였다. 남편의 여름휴가에 맞춰 평소보다 멀리, 길게 떠날 곳을 물색하다가 울릉도로 낙점한 것이다. LPG 충전소가 없어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당연히 짐을 줄여야 했다. 그래도 두 딸은 “휴가가 아니라 무슨 극기훈련 떠나는 것 같다”며 투덜거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원래 캠핑이 변수가 많지만, 처음 가보는 곳이니 더더욱 그랬다.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해수욕은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면 좋은 구경거리가 있고, 어디에 텐트를 치면 안성맞춤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띔해 주었다. 오기 전에 세세히 준비했지만, 살면서 경험한 사람들이 말이 더 귀했다.
“아이들은 여행을 통해,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남에게 도움 받는 것을 꺼리고 차라리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지나치게 깔끔한 태도가 오히려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 수 있다. 여행지에선 사람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인정 넘치는 따뜻한 관계를 맺을 기회도 많아진다.”
‘바람과 별의 집’이 세워지는 곳은 우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기도 했다. 가을색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백로와 추분 즈음에 떠난 경주 캠핑은 살아 있는 역사 교육 현장이었다. 경주, 그중 토함산 하면 불국사와 석굴암이지만 가족은 반대편으로 향했다. 감은사와 감포 바다를 보기 위해서였다. 가는 길에 우연찮게 월성 장항리 마을 절터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국보 제236호 월성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쪽 탑과 짝을 이룬 서쪽 탑은 납작하게 주저앉은 모양이었다. 일제강점기 도굴꾼들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캠핑은 아픈 우리 역사를 배우는 열린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다.
가족만의 캠핑을 떠나자
낭만과 모험 등의 단어가 떠오르지만 실은 캠핑은 소소한 갈등의 연속일 수도 있다.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먹느냐 등등 아무리 가족이라도 삶의 방식과 생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모두 삶의 무한한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은 나고 자라고 또 소멸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자라는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도 매순간 낡은 껍질을 부수어가면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 아이 몸이 자라면서 입고 있던 옷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집도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갑갑한 새장이 될 뿐이다.” 『열두 달 야영일기』의 책장을 덮으며 “우리 가족만의 캠핑을 떠나자”는 큰 아들의 요구를 바쁘다는 핑계로 내쳤던 일들이 후회된다. 곧 부모 품을 떠날 아들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일까. 책장을 덮으며 올봄에는 꼭 캠핑을 가리라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