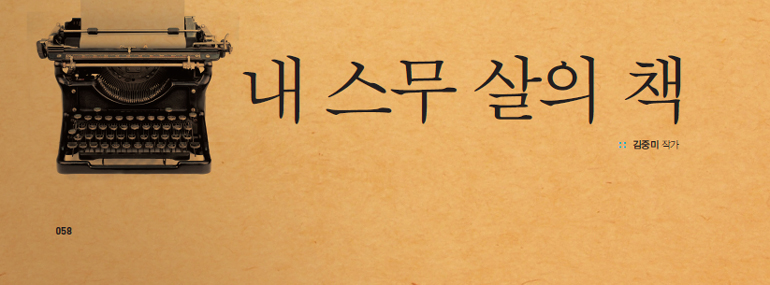작가/저자 내 스무 살의 책- 김중미 작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어렸을 때부터 얼뜨고 엉뚱했던 나는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영리한 아이들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힘센 아이들한테 당하는 게 싫어 혼자 놀 때가 많았다. 학교는 지루하고 답답했다. 나는 늘 그 지루함과 두려움에서 구해줄 우주소년 아톰과 마징가제트를 기다렸다. 내가 자란 곳은 미 2사단이 주둔해 있던 동두천이었다. 그곳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내게는 우리처럼 약한 이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 이가 필요했다. 아톰과 마징가제트가 일본 만화 캐릭터라는 건 알지도 못했고 중요하지도 않았다. 어 떤 책이 좋고 나쁜지 스스로 판단하거라…
초등학교 때부터 활자로 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읽었지만 육영재단에서 만든 자유교양문고와는 친해지질 못했다. 자유교양문고는 성웅 이순신, 그리스 로마 신화, 삼국유사를 비롯한 고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강제로 읽고 ‘자유교양경시대회’에 나가게 했다. 자유교양문고는 내게 자유는커녕 교양도 심어주지 못했다. 파랗거나 노란 색의 똑같은 표지에 원고지까지 달려 있던 그 책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자유교양문고와 더불어 읽기 싫어했던 책은 위인전이었다.
우리가 왜 미국 대통령의 위인전을 읽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을지문덕, 이순신 비롯한 장군들, 에디슨이나 닐 암스트롱 같은 과학자나 우주인의 이야기도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내가 바라는 영웅이 아니었다. 중학교 때는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주인집 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산 한국단편소설전집이나 윗집 동갑내기 남학생이 중학교 입학 선물로 받은 세계문학전집은 모두 내 차지였다. 기지촌에서 자란 탓인지 중학교 2학년 때는 『춘희』, 『마농레스꼬』 같은 책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책이라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삼촌들이 만화가게에서 빌려오는 성인만화나 무협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장롱 속에 감추어 두었던 『킨제이보고서』란 책까지 몰래 볼 정도였다.
부모님은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 뻔히 알면서도 별로 걱정을 하시거나 간섭을 하지않았다. 오히려 어떤 책이 좋고 나쁜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다. 고등학교 때는 책을 통해 부조리한 세상의 답을 구하려 했다. 가난한 집의 맏이였던 나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책임감에 짓눌려 실업계를 선택했다. 학교는 당연히 재미없었다. 암울한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라디오와 책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프랑소와즈 사강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드라마틱한 그의 삶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사강의 책을 샅샅이 구해 읽었다. 그러나 사강의 소설은 그의 삶만큼 감동적이지 않았다.
사강의 책 중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나는 죽는데 너는 태양 아래를 걷는가?』라는 인터뷰집이었다. 그 책을 통해 사강에게 영향을 준 작가인 푸르스트와 사르트르를 알게 되었고, 사르트르를 통해 시몬느 드 보봐르, 앙드레 말로, 카뮈, 레마르크를 만났다. 병 원 도서실에서 한국 근현대사에 눈뜨다아버지께서 대학 때 읽던 『말테의 수기』를 주신 것도 그 무렵이었다.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에다 인쇄는 조악하기 짝이 없고 횡서로 쓰여 있던 그 책은 나를 버지니아 울프, 카프카, 이상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고 2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 막연히 어른이 되면 사르트르나 네루다처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때쯤이었다.
고등학교 때 일어난 광주민중항쟁이 시로 은유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스무 살 때부터였다. 시어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병원의 원무과에 입사해 한 달에 보름씩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사무직 노동자에게 광주의 진실은 너무 멀었다. 그 대신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구로공단의 어린 노동자들과 봉천동, 신림동의 도시빈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병원 도서실은 내게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고 탐구할 대학이 되어 주었다. 병원 도서실 사서의 배려로 내가 원하는 책은 무엇이든 읽을 수 있었다. 병원 도서실 책꽂이에 <민중교육>, <공동체문화>, <실천문학> 따위의 무크지와 한길 근대 사상가 전집, 한길 제3세계 문학전집, 창비의 소설들이 꽂히면서 나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눈을 뜨고 두레니 품앗이니 하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82년, 근무하던 병원 바로 앞에 있던 원풍모방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원풍모방 투쟁은 어깨너머로 보았지만 그 사건을 기회로 노동자 편에 서는 교회를 만났고 성서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비로소 아톰이나 마징가제트 대신 진짜 구원자를 만난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세상을 구원할 이는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고통 받는 민중 곁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책은 외롭던 어린 시절의 소중한 동무였고,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주는 길동무였다. 또 스무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려준 삶의 훌륭한 길잡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