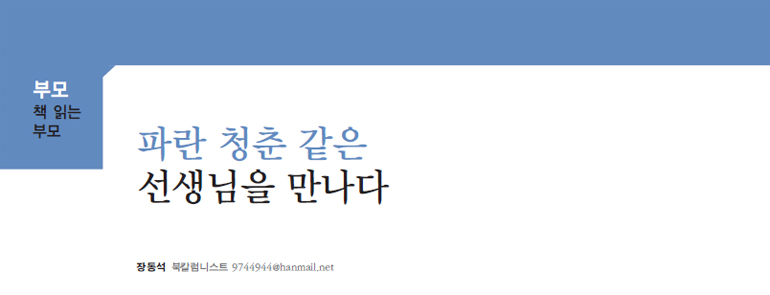부모 [책 읽는 부모]파란 청춘 같은 선생님을 만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학생을 자녀로 둔 모든 부모의 바람은 아마도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것일 게다. 좋은 담임선생님의 기준이 애매하지만, 인성과 더불어 성적까지 책임져 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성적에 있어서만큼은 학원 강사에 밀린 지 오래지만 대개의 부모들은 학교의,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아직까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사, 가르고 치다』는 이처럼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독특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책이다. 그것도 때론 과격하게, 때론 거친 숨결마저 토해내며 교사의 덕목을 이야기한다.
교사의 역할이 가르고 치는 일?
교사의 역할이란 모름지기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데 지은이는 교사는 ‘가르고’ ‘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지은이의 말로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적절할 듯싶다.
“기실 교사는 가르고 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고, 따뜻한 감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야(치기) 합니다. 이성과 감성의 강력한 균형이 가르치는 자들의 존재론이지요.”
지은이가 먼저 가른 것은 교사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10여 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표준을 거부한 삶을 실천하고 교육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고군분투 중”인 지은이가 보기에 교사는 스스로 전문성을 상실했다. 성적 지상주의라는 강박은 학생들을 노동자로 만들었고, 결국 교사들은 관리자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요즘 교사들은, 성적을 학원에 맡기고 있어서인지, “어쨌든 학교는 굴러간다”는 체념에 빠진 상태다. 그럼에도 “순종과 복종이 곧 교육이라는 믿음”이라는 인식만은 버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강박증과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강박과 불안을 이겨내는 지은이의 처방은 이렇다.
“상처와 불안과 공허가 밀려올 때, 너절한 통증이 허기와 호기를 자극할 때, 눈물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교사만이 더불어 성장하는 성장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불안을 긍정해야 합니다. 불안은 오히려 교육적인 징후입니다. 조금 도발적인 징후고 가끔 고통스런 증상이긴 합니다. 이제 성장을 위해 모두가 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교사로서 스스로를 반성한 지은이는 이내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가른다. 먼저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손님’이 된 현실을 비판한다. 교육이 시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평가와 통제만 있을 뿐, 진정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사라진 학교를 지은이는 “학교의 기업화, 교육의 시장화”라고 일갈한다.
그렇다고 마냥 교사와 교육의 현실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수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교사들만을 해바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학교가 내보낸 아픈 아이들 곁으로 달려가는 진실”만 있다면 품지 못할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체제가 주는 모순을 학습하는 열정과 더불어, 세상의 작은 희망과 변화를 꿈꿔야 한다”면서 “학교 담을 이제 교사들이 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시대의 좋은 선생님은 때론 학교 밖에서 수업합니다. 교사가 학교를 나가야 하는 이유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교사, 가르고 치다』
김준산 | 네시간 | 2012
교사, 스스로 당당한 주체이자 주인
가르고 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찾아야 한다. 자기로부터 혁명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동기부여는 물론 가치를 불어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공부해야 한다.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말처럼, 학생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다.
지은이는 교사를 일러 “파란 청춘 같은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파란 청춘 같은 선생님은 “삶과 사유, 독서와 노동이 양립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사람”이다. 말 그대로 스스로에게 당당한 주체이자 주인이다. 분명한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고, 따뜻한 감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까다롭고 힘든 일이다. 물론 보상도 그리 크지는 않고 보람도 대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모름지기 교사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우리 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때론 과격하지만 지은이의 진정이 책 곳곳에서 묻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