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뚝샘의 교사들을 위한 인문에세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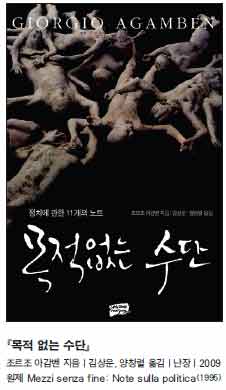
1. 거리 없는 거리
잠을 설쳤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네요. 날은 밝음을 위해 꾸역꾸역 준비 중인데, 몸은 더럽게 어두웠습니다. 학교에 일찍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자신 있게 쓸 수 없을 땐, 경험을 반복하는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동차 시동을 켜고 평소보다 과하게 달려봅니다. 도로의 안개가 몽환을 가르는 듯 환상적이었습니다. 늘 가는 길이지만, 참 달랐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당긴 것뿐인데, 달리는 도로는 달려왔던 도로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잠시 차를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알싸한 기분을 벼리고 싶어집니다.
순간, 살아 있다는 느낌이 몽실몽실 다가왔습니다. 때 묻지 않은 공기가 운전하는 기계가 된 신체를 숭고하게 위로해 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환상이 지각의 더께를 응축시켜 줍니다. ‘살아 있다’는 충동이 피부에 도장(인상)을 찍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고, 안개 속 저편에 보이는 자작나무 숲을 응시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의 춤사위를 뽐내는 숲은 깊은 공연장처럼 보입니다. 뚜벅뚜벅 걸으며 자연의 리듬을 따라 박자를 넣었습니다. 숲은 오케스트라가 되고, 저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듯 새벽 공기를 향해 당찬 연주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어둠을 가르고 불타는 태양이 솟습니다. 곧이어 축복의 몽상이 사라집니다. 잠에서 깨듯 주변을 살핍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빨리 달리는 세상 속에 홀로 낙오 된 느낌마저 듭니다. 숭고했던 흥분들이 파편이 되어 흩어집니다. ‘살아 있다’는 충동이 낯설어 집니다. 다시 차에 시동을 걸어 영혼 없는 기계 가 됩니다. 충만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을 응시하며, 풍경 없는 길을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기분을 반성하는 일이란 참으로 슬픕니다. 하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삶을 반성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삶
출근길. 제겐 거리가 없었습니다. 거리 없는 거 리에서 목적지를 향해 거리 위에 너무 많은 시 간을 보내는 운전 기계일 뿐이었지요. 과정 자 체가 문제가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제게 거리 자체를 즐기는 삶은 지워져야 할 시 간이었습니다. 종착지 없는 거리 위에 그저 그 거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과정은 필요 없는 낭 비입니다. 자작나무 숲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 깊숙이 느끼고 싶은 충동은 지속할 수 없는 과 잉이며 잉여일 뿐이었지요. 아쉽지만 아직 우리 에겐 거리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삶은 숙성돼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삶 자체가 문제가 되 는 삶, 살아가는 와중에 무엇보다 살아가는 방 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삶”이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미 우리의 몸은 거리 그 자체를 즐 길 수 있는 강도(intensity)적 감응을 잃어버렸을 까요? 더 이상 삶이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 니라 삶의 가능성이 문제되는 삶을 살아갈 수 는 없을까요? 출근하지 않고 길 자체에서 낭만 을 즐기다가 잠시 현실을 잊는 꿈을 꾸는 삶은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요?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이러한 현대인들을 ‘호모 사케르’(신성한 인간)라고 정의 합니다. ‘호모 사케르’란, 살아 있다는 생명 자체 만을 신성화시키는 인간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 존이 되어버린 존재를 뜻하지요.
로마 시대까지 인간은 사회적 생명(비오스, bios)과 생물학적 생명(조에, zoe) 모두를 가진 존 재였답니다. 생물학적 생명인 조에(zoe)는 ‘추방 된 자’ 혹은 노예들에게만 정의되는 생명 개념 입니다. 일종의 ‘예외 상태’ 속에서만 정의할 수 있는 생명이지요. 반면 시민이라 명명되는 사람 들은 생물학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을 모두 가진 존재였습니다. 기실 사회적 생 명권 박탈은 인간 자체의 죽음이었지요. 당시에 는 살아 있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캐묻는 존재를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았 습니다. 사회적 생명의 암살은 인간이란 개념의 상실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살아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생명은 존재를 설명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 그 이상을 정의하는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내용 없는 인간(L’uomo senza contenuto)”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삶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게 되었으니까요. 장수가 삶의 최전선이 된 사회입니다.
아감벤에게 있어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사태 속에 사는 창피함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종의 난민처럼 생명 그 자체만이 문제시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 위에서 낭만을 즐기며 숲과 교감하는 삶이 불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 회색 포장도로를 이유 없이 달려야 하고, 목적 없이 우리의 생명은 끝없이 재생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의심 없이 달려야 합니다. 덜 달리고 싶다는 충동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탈색돼야 하지요. 잠시 멈춰 생명의 맛을 향유하는 쾌락은 살아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수치화 되었습니다. 잠재적 정의나 가능성을 향한 생명력에 대한 질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생명 자체만이 문제시되는 삶이란, 잠재성과 가능성이 박제화 된 삶입니다. 마치 전시 상태의 난민처럼 살아가는 삶이지요. 난민촌에서 사람들은 물리적 생명만이 문제되는 ‘예외 상태’로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것이 되어 버린 예외상태에서 사회적 생명인 비오스(bios)”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권은 생물학적 생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살아가는 와중에 삶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삶”은 지워진 것이지요. 푸코의 말처럼 인간이란 개념도 바닷가 모래알의 낙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생명’이 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현실뿐입니다. 인간은 사라지고 인간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남은 흔적을 우린 생명이라고 구차하게 부르지만 말이지요.
현실만이 문제시되는 삶 속엔 타인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난민촌이 공동체가 아닌 ‘일종의 무리’인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나와 다른 생명(생존)을 가진 존재일 뿐이지요. 때문에 우린 매우 외롭습니다. 무리가 된 공동체 속에 타인은 단지 다른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항상 이미 현실태일 뿐인 존재들, 항상 이미 이런 저런 것, 이런저런 정체성일 뿐인 존재들, 그것들에 완전히 자신의 역량을 탕진해버린 존재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동체도 있을 수 없으며, 그저 일치나 사실적인 구분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잠재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목적 없는 수단』, 21쪽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잔재들이 우리들의 사 회적 생명입니다. 너와 내가 거침없이 닿고 엮이는 관계 속에 인간의 생명은 오롯이 홀로 설 수 있는 법이지요.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라 도 공동체는 비오스들(사회적 생명)의 전쟁터가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쌩쌩 달리는 도로는 전쟁의 한복판을 이탈 하려는 용기를 다그칩니다. 어서 도착해서 생명 을 위한 맹목적인 전투를 진행하라고 재촉합 다. 자작나무의 하얀 속살이 보여 주는 춤사위를 감상하는 인간은 사라졌다고 외치는 듯합니다. 비극이지만 연극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선 벌어야 하고, 조건 없이 벌기만 하는 상처가 두려워 잊고 잃어야 하는 게 우리 들의 세상이니까요. 사회적 생명을 용기내기엔 우린 너무 바쁘고 빠릅니다.
3.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비극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범죄라는 법적 개 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수용소 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일어난 게 특유의 법적–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수용소는 비현실적 공간이며, 우 리가 사는 세계는 그와 같을 수 없다고 단정 짓 곤 하지요. 수용소가 비현실적 공간이기 때문 에 수용소의 메커니즘을 현실이 아니라고 단정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가 비현실적 공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수용소적 전략이 현실에 적용되기 쉽습니다. 수용소에 대한 우리들의 착시현상은 수용소적 현상을 감각하는 감정을 은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수용소처럼 생물학적 생명만을 유용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현 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수용소의 난민이 된 우리에게 시민의 권리나 사회적 참여 같은 사회적 생명은 미약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 있다는 그 자체의 현실성이지요. 이 현실성은 잠재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가능성을 증폭하는 잠재적 역량 강화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악한 사태이지요.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의 감각은 현실적인 것들 속으로 미끄러집니다. 현 실적인 가치들만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단지 살 아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비극적인 존재로서 말이지요.
비참하고 비루한 삶이란, 생명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입니다. 감각이 마비되고 풍 부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외로운 난민들인 이 유입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만이 존재 이유인 사람들에게 세상은 늘 ‘예외 상태’며, 타인은 단지 생존을 유지하는 다른 존재일 뿐입니다. 생명만 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동지는 없습니다.
서양정치의 근본적인 대립의 범주는 ‘동지–적’이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정치적 존재’, ‘조에(zoe)–비오스(bios)’, ‘배제–포함’이라는 범주쌍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에게서 벌거벗은 생명을 분리해 내며, 그것을 자신과 대립시키는 동시에 그것과의 포함적 배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 『호모 사케르(Homo Sacer)』(조르조 아감벤, 새물결, 2008)
이 사회는 산책하는 인간 혹은 특정한 감정들에 관심 있는 사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벤야민의 말을 빌리면 산책자는 ‘시장의 정찰병 같은 사람’입니다. 순간의 변증법을 인정하고 삶의 여유를 가능성으로 승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요. 흘러가는 시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자기만의 특질들로 새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란 이러한 사람들의 충돌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정치란, 새로움이 출몰하는 공간이며, 생존을 넘어 존재를 자각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벌거벗은 생명들과의 대칭은 존재를 정치적으로 쓸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충족은 생존 그 자체며 우리의 만족은 생명 유지의 욕망 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아감벤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자신의 벌거벗고 헐거운 삶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들의 무리 그 이상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이 불가능한 사회이지요. 이 시대에 동지가 사라진 이유는 우리의 사회적 생명이 사멸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우리의 공동체는 생존을 위한 무리입니다. 마치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같은 밥상과 좁은 침실을 공유하는 생명들처럼 말이지요.
4. 도래할 공동체를 위하여
하지만, 난민촌에도 꽃은 피었답니다. 저주받은 곳에서도 인간은 삶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희망은 그 상황 자체를 즉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창조해 내는 역량 있는 삶의 가능성은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강력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잔혹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우리의 수용 능력입니다. 감각의 예민함 같은 것이지요. 생명에 대한 예민한 자각은 잃어버린 감각을 복원시켜주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느낌들에 대한 사유는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우리들의 공부 방법인 것이지요. 우리는 생명에 대한 다양한 자각을 위해 현실적이라는 우리들의 스펙터클을 잠시 유보해야만 합니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종착지를 미뤄둔 채 삶의 거리를 거리 그 자체로 살펴봐야 하지요. 거리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거리 그 자체가 우리들의 시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루함을 잊기 위한 여행이라도 좋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만이 존재를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이니 까요.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현실에 “지체 없는 수 정”을 가해야 합니다. 유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감벤이 주장한 새로운 실험은 수정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분명 우리 의 삶은 수정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심 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모른 척할 시간이 없습니 다.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 틀 속에, 같은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극복할 수 없다고 회의할 기회조차 없 을지도 모릅니다.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 체 념하자고 타이를지도 모릅니다. 내 이웃이, 당신 의 친구가 뜬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칠지도 모릅 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우린 강력하게 이 야기하고, 지체 없이 수정하자고 설득해야 합니 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 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고 그토록 사랑 하는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의 문제입니 다. 서둘러야 합니다. ‘내용 없는 인간’을 극복하 기 위해 ‘목적 없는 수단’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 해방되었을 때 난민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 의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두에 선 한 사 람의 용기가 억압의 문을 해방의 문으로 만들었 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체념이라 는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용기밖에 없습니 다. 누구라도 먼저 해방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가 아닌 둘이라면 더 좋겠지요. 다른 사람 에게 강요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지체 없이 자유 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 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난민촌에선 자유와 행복을 충전할 수 없습니 다. 의심하고 사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 인간이란 고유한 생명의 복원을 위하여 같이 쓰고 새로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의 가 장 큰 비극은 비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반 복컨대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 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불쌍한 생명 으로, 저주받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과 감해져야 합니다. 외칩시다. 분노합시다. 해방의 문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갑시다. 잠시 고통스러 울 뿐입니다. 자유는 고통을 극복하는 이들만 이 누릴 수 있는 인간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시 간입니다.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도래할 공동체는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문제되는 삶들이 충돌하는 자유로운 실험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기다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