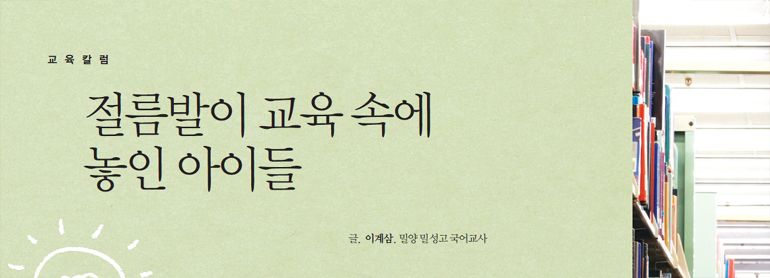칼럼 절름발이 교육 속에놓인 아이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수업이 없는 시간, 교무실에서 문득 창밖을 보니 운동장가에 도열한 벚꽃들이 활짝 피었다. 먼 산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점점이 흩뿌려져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온 세상이 꽃천지가 되는 시절을 지나고 있다. 어제는 간만에 산길을 걸었다.
방싯방싯 웃는 듯 곳곳에 붉은색 물감을 흩뿌려놓은 듯 피어난 진달래를 보며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실실 웃기도 했다. 고운 잎은 어디에서 왔을까, 유행가 가사를 되뇌며 천천히 걸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어느 글귀가 생각났다. ‘이름도 없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저들은 저리도 아름다운데 인간사는 이렇게 끝도 없이 비루하기만 한지, 새삼스러운 생각에 마음저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서해 백령도 앞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아 있을 40여 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끌려와서는 이렇게 어이없이 떼죽음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고, 이런 죽음을 끌어다 묻으며 유지되는 저거대한 무력의 체제가 끔찍하다. 그 뿐인가. 4대강 사업이 있다. 내가 목격한 함안보의 거대한 가물막이판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공사 현장의 모습을 생각한다. 어디 기계제국에서 온 듯 어마어마하게 큰 굴삭기들의 행렬, 함안보에서부터 내가 사는 밀양까지 강변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빨간 깃발들, 그리고 제멋대로 파헤쳐진 강을 생각하면 이 봄날 꽃천지의 나른한 감상은 깃이 젖은 햇닭처럼 금세 풀이 죽고 만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세상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있는 듯 허세를 떠는 일도, 무어라무어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일갈하는 일도 건방진 일이라는 것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몸짓을 쉼 없이 반복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한정된 테두리로 귀환한다. 지금 나에게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맡은 고3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북카트’를 돌리고 있다. 내가 집에서 가져온책 100여 권과 도서관 책 120여 권을 장기대출해서 1인당 1권씩 돌아가게끔 준비하고, 보충수업이 없는 수요일 8교시마다 한 권씩 골라잡아 1주일간 읽었다가 다시 수요일 오전까지 반납하게 하는 제도다. 거기에 내가 아끼는 책들, 그리고 아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을 끼워 넣었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박정희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알아야 하기에 만화『박정희』를 끼워 넣었고, 전태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인지를 알아야 하기에 만화 『태일이』를 끼워 넣었다. 아이들이 수요일 8교시마다 교탁 위에 펼쳐진 책꾸러미들 앞에서 수선을 떨며 책을 고르고, 그렇게 고른 책을 제 자리에 앉아 고요히 읽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기분좋은 일이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이 그나이대의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지, 그 책으로 인해 아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최소한 나에게는 희미하다는 것을. 나는 어느 순간부터 책이 책으로써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책과 책이 지시하는 책 바깥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크나큰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독서는 도피와 위안의 기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삶의 현실을 변혁할 기제가 되기에는 아이들을 둘러싼 현실이 너무 강파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책 바깥에는 당장 어제 치른 모의고사 점수와 이번 학기에 받아야 할 내신 등급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스펙과 관련되는 온갖 육체적 심리적 고통들이 짐승의 혀처럼 널름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다만 책 속에서 잠시 쉬고 싶고, 쉬기 위해서 책을 붙잡는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은 ‘책’이 아니라 ‘친구’임을 또한 나는 알고 있다. 교육은 애초부터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이들에게 주어진 천부의 권리, ‘몸과 시간’을 구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근대 교육의 원천적인 한계가 작동하고 있다.
거기에 정글 같은 경쟁으로써 오직 ‘인적 자원’의 등급 감별에만 골몰하는 한국 교육의 극악한현실이 엎어져 있다. 너무 힘이 들어 학교 바깥으로의 탈주를 여러 차례 꿈꾸기도 했지만, 나또한 이 바닥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질적 안락에 어느 순간 나도 물들어버렸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리라.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고 칼 마르크스가 인용했던 이솝우화의 한 대목,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라는, ‘지금 여기’를 버리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조금씩 가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어이없는 현실이 금 그어 놓은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 차라리 나는 무력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살갑다. 살아있음의 몸부림, 살아있고 싶어 하는 절절한 육성(肉聲)이 그리웁다. 어디서든 이 안락의 장막을 찢어발기는 몸부림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일도 해야 할 일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일은 지율스님이 찍어 놓은 4대강 사업 사진전시회를 준비한다. 다음 날도, 그 다음날도 일은 이어진다. 아, 방금 학교로 ‘뒤처짐없는 학교’에 공모하라는 공문이 날아들었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1~2천만 원을 줄 테니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선별하여 수업을 하라는 것이다.
급식지원예산은 삭감해 놓고, 아이들에게 열등의 깊은 상처만 아로새길 이 어처구니없는 세금낭비를 최소한 내 자리에서는 막아낼 길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직원회의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 뭐라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살짝 두통이 스쳐간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교단에 서 있는 한 끝끝내 돌아야 할 무한반복의 트랙이다. 이렇게 사는 것도 살아가는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부디, 이 모든 일들이 즐거울 수 있기를. 고래 뱃속 같은 세상에서 작은 이물질의 꼼지락거림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방싯방싯 웃는 듯 곳곳에 붉은색 물감을 흩뿌려놓은 듯 피어난 진달래를 보며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실실 웃기도 했다. 고운 잎은 어디에서 왔을까, 유행가 가사를 되뇌며 천천히 걸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어느 글귀가 생각났다. ‘이름도 없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저들은 저리도 아름다운데 인간사는 이렇게 끝도 없이 비루하기만 한지, 새삼스러운 생각에 마음저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서해 백령도 앞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아 있을 40여 명의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끌려와서는 이렇게 어이없이 떼죽음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고, 이런 죽음을 끌어다 묻으며 유지되는 저거대한 무력의 체제가 끔찍하다. 그 뿐인가. 4대강 사업이 있다. 내가 목격한 함안보의 거대한 가물막이판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공사 현장의 모습을 생각한다. 어디 기계제국에서 온 듯 어마어마하게 큰 굴삭기들의 행렬, 함안보에서부터 내가 사는 밀양까지 강변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빨간 깃발들, 그리고 제멋대로 파헤쳐진 강을 생각하면 이 봄날 꽃천지의 나른한 감상은 깃이 젖은 햇닭처럼 금세 풀이 죽고 만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세상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있는 듯 허세를 떠는 일도, 무어라무어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일갈하는 일도 건방진 일이라는 것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몸짓을 쉼 없이 반복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한정된 테두리로 귀환한다. 지금 나에게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맡은 고3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북카트’를 돌리고 있다. 내가 집에서 가져온책 100여 권과 도서관 책 120여 권을 장기대출해서 1인당 1권씩 돌아가게끔 준비하고, 보충수업이 없는 수요일 8교시마다 한 권씩 골라잡아 1주일간 읽었다가 다시 수요일 오전까지 반납하게 하는 제도다. 거기에 내가 아끼는 책들, 그리고 아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을 끼워 넣었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박정희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알아야 하기에 만화『박정희』를 끼워 넣었고, 전태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인지를 알아야 하기에 만화 『태일이』를 끼워 넣었다. 아이들이 수요일 8교시마다 교탁 위에 펼쳐진 책꾸러미들 앞에서 수선을 떨며 책을 고르고, 그렇게 고른 책을 제 자리에 앉아 고요히 읽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기분좋은 일이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이 그나이대의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지, 그 책으로 인해 아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최소한 나에게는 희미하다는 것을. 나는 어느 순간부터 책이 책으로써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책과 책이 지시하는 책 바깥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크나큰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독서는 도피와 위안의 기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삶의 현실을 변혁할 기제가 되기에는 아이들을 둘러싼 현실이 너무 강파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책 바깥에는 당장 어제 치른 모의고사 점수와 이번 학기에 받아야 할 내신 등급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스펙과 관련되는 온갖 육체적 심리적 고통들이 짐승의 혀처럼 널름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다만 책 속에서 잠시 쉬고 싶고, 쉬기 위해서 책을 붙잡는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은 ‘책’이 아니라 ‘친구’임을 또한 나는 알고 있다. 교육은 애초부터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이들에게 주어진 천부의 권리, ‘몸과 시간’을 구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근대 교육의 원천적인 한계가 작동하고 있다.
거기에 정글 같은 경쟁으로써 오직 ‘인적 자원’의 등급 감별에만 골몰하는 한국 교육의 극악한현실이 엎어져 있다. 너무 힘이 들어 학교 바깥으로의 탈주를 여러 차례 꿈꾸기도 했지만, 나또한 이 바닥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질적 안락에 어느 순간 나도 물들어버렸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리라.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고 칼 마르크스가 인용했던 이솝우화의 한 대목,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라는, ‘지금 여기’를 버리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조금씩 가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어이없는 현실이 금 그어 놓은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 차라리 나는 무력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살갑다. 살아있음의 몸부림, 살아있고 싶어 하는 절절한 육성(肉聲)이 그리웁다. 어디서든 이 안락의 장막을 찢어발기는 몸부림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일도 해야 할 일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일은 지율스님이 찍어 놓은 4대강 사업 사진전시회를 준비한다. 다음 날도, 그 다음날도 일은 이어진다. 아, 방금 학교로 ‘뒤처짐없는 학교’에 공모하라는 공문이 날아들었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1~2천만 원을 줄 테니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선별하여 수업을 하라는 것이다.
급식지원예산은 삭감해 놓고, 아이들에게 열등의 깊은 상처만 아로새길 이 어처구니없는 세금낭비를 최소한 내 자리에서는 막아낼 길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직원회의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 뭐라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살짝 두통이 스쳐간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교단에 서 있는 한 끝끝내 돌아야 할 무한반복의 트랙이다. 이렇게 사는 것도 살아가는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부디, 이 모든 일들이 즐거울 수 있기를. 고래 뱃속 같은 세상에서 작은 이물질의 꼼지락거림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