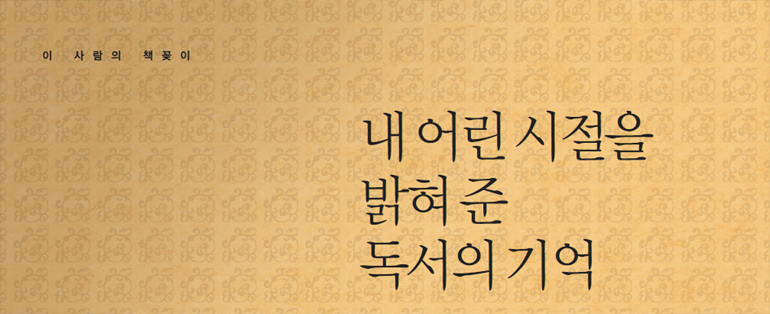작가/저자 이 사람의 책꽂이 - 내 어린 시절을 밝혀 준 독서의 기억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어려서 처음 읽은 책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말, 결혼기념일이면 늘 부부동반 외식을 가시던 아버지가 노벨 전기와 인목대비 이야기책을 사들고 오셨는데 그 책을 밤새워 읽은 일이다. 노벨 전기에서는 노벨이 우여곡절 끝에 니트로그리셀린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훗날 자신의 연구가 엄청난 살상을 가져온 현실을 보면서 전 재산을 상금으로 기탁한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다면, 인목대비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정치적 반전을 통해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처럼 그보다 먼저 만난 책은 만화였다. 1960년대 서울 골목길에는 만홧가게가 많았다.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 어두컴컴하고 조그만 가게에 앉아 정신없이 만화를 보다 보면 누나들이 찾으러 오기도 했고, 한낮에 들어갔다가 저녁 어스름에 나오기도 했다.
만화 이외에 나를 독서로 이끈 또 하나는 신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참 좋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침 조회 때 ‘새소식’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에는 전날 저녁이나 그날 아침 신문에서 읽은 소식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다. 그 시간을 위해 부모님을 졸라 ‘소년○○’신문을 열심히 구독했고, 아침마다 선생님의 지명을 받으려고 열심히 손을 들었다. 그 무렵 성적표 통신란에 ‘새 소식 시간 발표가 좋다’고 쓰여 있던 기억이 난다. 신문 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어려운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 일로 발전하였고, 고학년이 되면서는 어른 신문을 기웃거리는 일까지 생기면서 한자사전을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독서에 필요한 어휘력 훈련이 된 셈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독서의 시작은 5학년 때로 기억된다.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5학년 수업에는 일주일에 한 시간‘자료’라는 과목이 있었다. 이 시간은 초보적이지만 도서관과 박물관이 결합된 형태의 ‘자료실’에서 진행되었다. 자료실에는 4학년 담임선생님의 동생이기도 한 어여쁜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 옆에는 분류 카드가 든 서랍장이 있고 맞은편에는 둥근 열람대가 있었다. 서가는 기역자 형태의 개가식이었는데 앞뒤로 책이 꽂혀 있었지만 가나다순이어서 찾기 쉬웠다. 서가 안쪽에는 커다란 멍석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거기에 앉기도 하고 누워 뒹굴기도 하면서 책보는 맛은 집에서와 같은 편안함을 주었다. 더구나 돗자리 옆에는 어린이 잡지도 꽂혀 있었다. 나머지 공간은 50자리 정도의 열람실과 뺑 둘러 볕에 붙은 허리 높이의 장식장 속과 그 위에 놓인 생물 표본, 지구본등으로 채워져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자료실’의 압권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자료’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대화는 대화처럼, 설명은 설명처럼 감칠맛 나게 읽어주셨는데, 늘 연속극 같이 호기심을 잔뜩 자극한 대목에서 끝이 났으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을 읽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책이 불이 나게 대출되었고, 순서를 기다리다 못해 몇 친구가 책을 사면 다시 그 친구들에게 줄을 서서 빌려보곤 했다. 언젠가는 『솔로몬의 동굴』을 읽어 주셨는데, 아스라이 보이는 스리망 산에서 죽을힘을 다해 도망쳐 사막을 건너온 사람이 해 준 이야기와 지도를 가지고 탐험에 나서는 대목에서 끝이 나서 그 책을 빌려 읽으려고 애태우던 기억이 난다.
『괴도 루팡』, 『셜록 홈스』 시리즈, 『정의는 이긴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등은 모두 그 시간이 읽게 해 준 책들이다. 그렇게 시작된 독서 편력은 집이 넉넉한 옆 집 친구의 책을 빌려 읽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 집에는 예쁘게 장정된 50권 전 집이 있었고 그 안에 『소공자』, 『소공녀』, 『톰 소여의 모험』, 『장발장』, 『작은 아씨들』, 『왕자와 거지』 같은 무궁무진하게 재미있는 책들이 있었다. 아마도 거의 두세 번씩은 읽지 않았나 싶다. 지금에 와서 보면 모두 서양 책이고, 알게 모르게 그 속에 담긴 서양 중심 세계관이 내게 영향을 끼쳤을 터다.
고등학교에 와서는 2학년 여름에 읽은 『논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집이 시골로 이사를 가서 서울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니던 내가 우연히 서가에서 뽑아 읽은 『논어』는 대학교 출판부가 펴낸 교양문고였지만, 막연히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했던 내게 동양철학을 공부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0여 년 전 후배가 청소년을 위한 『논어』 번역본을 내면서 서문을 써달라고 청해 왔을 때 『논어』가 떠올라서 찾아보았는데, 서가에 꽂혀 있는 빛바랜 책을 꺼내보고 놀랐다. 1966년에 나온 책인데도 한문 투 없이 이렇게 쉬운 말로 번역했다니. 그 책은 30여 년이 지나서까지도 내게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두보의 시에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이 있다. ‘다섯 수레의 책’을 봐야 한다니 사람 기죽이기 딱 좋은 말이다. 하지만 박제가의 『북학의』를 보면 중국 수레 종류에 사람 타는 수레, 짐 싣는 수레, 작은 장사꾼의 외바퀴 수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중요한 것은 수레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책의 수준 문제일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 본다. 작은 수레라도 ‘다섯 수레’만큼 볼 수 있다면 그게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