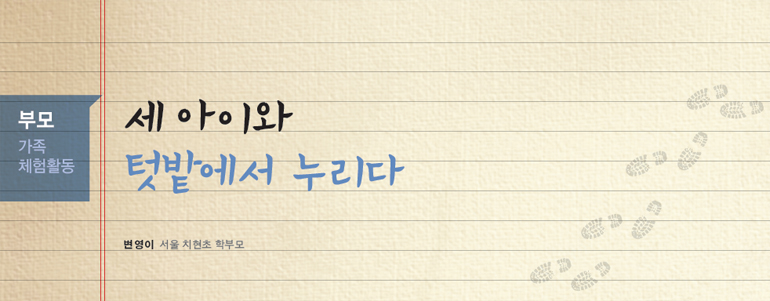부모 [가족 체험활동]세 아이와 텃밭에서 누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초보 농사꾼의 텃밭
아이들과 텃밭을 꾸려온 지 올해로 3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해 보이겠지만 실은 서툰 초보 농사꾼일 뿐이다. 시작은 2010년 강서 주말농장 반을 뚝 떼어준 독서모임 지인 덕분이었다. 처음으로 떠나기에 앞서 준비한 것은 『어진이의 농장 일기』를 아이들과 함께 읽는 거였다. 어릴 적 어중간한 시골에서 자란지라 농사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 좋은 선택이었다. 상추,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모종을 사다 놓고, 책도 간간히 살펴보며 시작을 했다. 함께 가기만 하는 거라며 뒤로 빼던 남편이 고맙게도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 아빠가 땅을 고르고, 고랑도 만들고, 구멍을 뚫어주면, 아이들이 모종을 척척 넣어주니 금세 일이 마무리되었다. 막내 지한이는 어찌나 물을 열성적으로 주는지 남편이 걱정을 한다. “저리 많이 주면 썩을 텐데.” 모종을 심어놓고 돌아서는데, 그 뿌듯함이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주말에 물 주러 갔다가, 이 밭 저 밭 식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아이들이 물을 줄 때 올라오는 흙냄새, 풀냄새가 좋아 더 머무르다 오곤 했다.
어느 날 태풍과 긴 장마가 지나가고, 오랜만에 텃밭에 들렀는데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꺾어지고 널브러지고, 잡초는 왜 그리 많고 크던지. 그 텃밭의 모습에 엄두가 나질 않아서 가을 농사를 포초보 농사꾼의 텃밭아이들과 텃밭을 꾸려온 지 올해로 3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해 보이겠지만 실은 서툰 초보 농사꾼일 뿐이다. 시작은 2010년 강서 주말농장 반을 뚝 떼어준 독서모임 지인 덕분이었다. 처음으로 떠나기에 앞서 준비한 것은 『어진이의 농장 일기』를 아이들과 함께 읽는 거였다. 어릴 적 어중간한 시골에서 자란지라 농사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 좋은 선택이었다. 상추,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모종을 사다 놓고, 책도 간히 살펴보며 시작을 했다. 함께 가기만 하는 거라며 뒤로 빼던 남편이 고맙게도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 아빠가 땅을 고르고, 고랑도 만들고, 구멍을 뚫어주면, 아이들이 모종을 척척 넣어주니 금세 일이 마무리되었다. 막내 지한이는 어찌나 물을 열성적으로 주는지 남편이 걱정을 한다. “저리 많이 주면 썩을 텐데.” 모종을 심어놓고 돌아서는데, 그 뿌듯함이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주말에 물 주러 갔다가, 이 밭 저 밭 식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아이들이 물을 줄 때 올라오는 흙냄새, 풀냄새가 좋아 더 머무르다 오곤 했다.
어느 날 태풍과 긴 장마가 지나가고, 오랜만에 텃밭에 들렀는데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꺾어지고 널브러지고, 잡초는 왜 그리 많고 크던지. 그 텃밭의 모습에 엄두가 나질 않아서 가을 농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뒤로도 어찌나 찜찜하던지. 볼 일을 보고 제대로 닦지 못한 기분이 상당히 오래갔다. 그러다가 막내의 어린이집에서 열린 ‘행복한 정원사’ 부모교육을 듣게 됐다. 거기서 농사에는 3가지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을 때, 거둘 때, 장마 지나 잡초 제거해 줄때. 우리의 실패 원인은 바로 때를 놓쳤던 것이었다.
아이들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다
작년에는 독서모임에서 공동 텃밭을 해보자고 했다. 함께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공동 작업을 하고, 가족끼리 돌아가며 물 당번을 하자고 했다. 작년의 아쉬움을 해소할 길이 있겠지 싶어 함께하기로 했다. 9호선 개화역 옆으로 시멘트 길을 지나 흙길이 나오는데, 논옆에 있는 텃밭이었다. 15평을 계약하고, 처음 텃밭에 갔던 날은 바람이 유난히도 거세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추운 줄도 모르고, 비료도 주고 흙도 고르고 모종을 심었다. 그날도 막내 지한이는 물조리개로 열심히 물을 주더니, 돌아올 때 옷이 다 젖어 있었다. 텃밭옆에 논두렁이 주는 혜택도 많았다. 우리 아이들 눈에 띄는 게 어찌나 많던지. 빈 물병에 물방개, 개구리들을 담아놓고 집에 가서 키우고 싶다고 졸라댄다. “얘들아, 그건 강제 이주가 아닐까. 너희들을 가족 옆에서 떼어다가 다른 데 데리고 가도 좋아?” 아이들과의 실랑이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아이들 눈엔 옥수수 잎에 붙어있는 손톱만한 청개구리도 그리 잘 보이는 건지. 여러 번 수난을 당한 개구리들이 몸살 앓았을 듯하다. 주말 오후가 되면 컵라면, 커피를 들고 가서 간단히 요기를 한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노을이 지면 새색시 얼굴 같은 발그레한 하늘이 우리를 감싼다.
그 하늘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도 추억으로 물들어 갔으리라. 봄 농사 수확물인 옥수수, 부추, 깻잎을 놓고, 그 풍성함에 농사꾼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도 했다. 밭에서 옥수수를 찌고, 부추, 깻잎으로 부침개도 만들어 소박한 파티를 벌였다. 우리만 먹기 미안하여 곁에 계신 분들한테 한 점씩 손으로 떼어 건네 드리며 작은 나눔의 정도 느껴봤다. 텃밭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다. 배추, 당근, 파, 무 등을 뽑아 손수레에 실은 큰 아들 재혁이~ 뒤집지 않고 무사히 온 게 제법이다. 그러다 손수레 안을 들여다보고 감탄이 나온다.
아이들이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솜씨를 보면서 총각네 야채가게 하라며 농을 건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당근 수확할 때 아이들이 제일 신나 했다. 땅에 씨를 뿌리고 물도 똑같이 주었는데, 어떻게 다양한 크기의 당근이 나왔을까? 실오라기 같은 크기부터 커다란 당근까지 캐어놓으며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배추를 뽑을 땐 무농약임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많은 벌레들 등장에 놀라기도 했다. 그해 마지막 발걸음을 하던 풍경이 지금도 생각난다. 금방 모내기를 끝내 아기 같던 벼들이 청년처럼 쑤욱 자라나더니,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 사라져 버리고 쓸쓸한 들판이 되어 버렸다. 이제 텃밭도 품고 있던 걸 모두 내어주고 배춧잎으로 이불 덮고 있다. 일 년 동안 서툰 농사꾼들 상대하느라 고생했다.
텃밭에서 가족의 추억을 거두다
올해는 작년에 심었던 것 외에 감자, 오이, 참외, 수박, 땅콩, 딸기 등 다양하게 심어보았다. 아이들이 보는 재미도 있으라고. 감자꽃은 제때 잘라주어야 열매가 굵고 실해진다고 한다. 막상 꽃을 잘라내고 보니 예뻐서 버리기가 아까웠다. 조그만 유리병에 꽂아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려놓았더니, 오며가며 “감자꽃을 보려면 감자밭에 가야해.”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들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집 식탁을 풍요롭게 했던 것은 바로 상추였다. 자꾸 뜯어다 먹어도 금세 소복이 자라는 상추가 있어서 텃밭에서 돌아올 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좋다. 다양한 식물을 심었더니, 결실을 맺었는지 궁금하여 발걸음이 잦아졌다. 아이들과 텃밭에 도착하고선 계속 감탄하는 우와~ 소리만 해댄다. 텃밭에선 자연이 주는 힘으로 수다쟁이가 된다는 말에 완전 공감을 하는 순간이다. 참외가 달려 초록빛을 띠고 있자, 지한인 “엄마, 참외가 이상해~ 초록색이야.” 한다. 마트에서 노란색의 참외만 보던 막내 눈엔 이상해 보였나 보다. 마트에 있는 결과물만 보고 컸던 아이들에게 텃밭에서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지금은 무와 배추를 심어 놓고, 곧 있을 땅콩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녀석들이 땅 속에서 딸려 나올지 기대된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기다림 뒤에 보여주는 뿌리채소는 수확의 매력이 참으로 크다.
세 아이와 함께 3년 동안 텃밭을 드나들고 있다. 밭에서 제일 자주 하는 게 물주기이다. 식물에게 물을 많이 주면 우리 눈에는 빠른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는 제대로 뻗어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식물 스스로 뿌리를 뻗어 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약하게 되는 셈이다. 어찌 보면, 텃밭 가꾸기는 우리아이들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 엄마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빨리 크라고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쏟는데, 정작 스스로 할 일을 못 찾아가는 약한 요즘 아이들이 아닌가. 그렇다고 방관을 해서도 안 된다. 밭에 있는 식물들은 농부의 발걸음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이야기도 있다. 적당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아야 하는 건 아이나 식물이나 똑같다. 텃밭에서 물주기의 정답은 없다. 평상시에 3일에 한 번씩 물 준다고 해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땅이 마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 건조함을 좋아하는 식물, 비슷해 보여도 식물마다 다른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밭에 있는 여러 식물들에 물을 뿌릴 때 그 특징에 맞게 조절해서 주어야 한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을 몸으로 배워 나갈 수 있음이 작지만 큰 또 하나의 혜택이다.
아이들과 텃밭 하나 가꿨을 뿐인데, 씨 뿌리고 물 주면서 맛난 것 나눠 먹으며 많은 걸 두둑이 쌓았다. 바로 소중한 추억들이다. 아직 우리 가족은 서툰 농사꾼이지만, 올해를 지나 내년에는 좀 더 쉬이, 땅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세월이 지나 고향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텃밭에서 즐겼던 이때가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추억 보따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