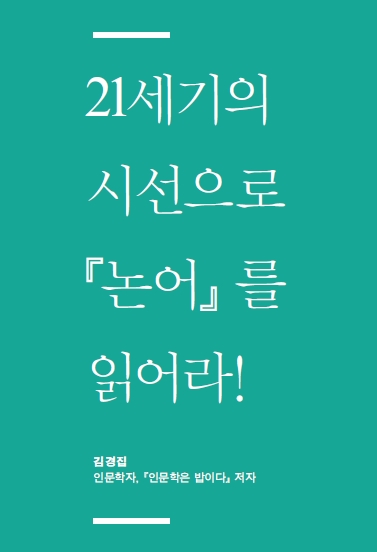도서관 활용수업 [고전읽기는 왜?] 21세기의 시선으로 논어을 가져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김경집
인문학자, 『인문학은 밥이다』 저자
인문학자, 『인문학은 밥이다』 저자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왜 지금 다시 『논어』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논어』는 사람의 도리와 국가의 통치법을 이야기한 공자의 어록이다. 공자 사상의 진수인 『논어』는 개인과 시대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이며, 철학서 이전에 뛰어난 상징과 비유가 담긴 문학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텍스트 자체가 열려 있어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논어』 이해는 도식적이거나 권위적이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오늘의 눈으로 『논어』를 읽을 수 없다.
왜 지금 다시 『논어』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논어』는 사람의 도리와 국가의 통치법을 이야기한 공자의 어록이다. 공자 사상의 진수인 『논어』는 개인과 시대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이며, 철학서 이전에 뛰어난 상징과 비유가 담긴 문학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텍스트 자체가 열려 있어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논어』 이해는 도식적이거나 권위적이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오늘의 눈으로 『논어』를 읽을 수 없다.
공자가 살던 중국은 춘추전국시대(BC 8세기~BC 3세기)로 주왕조(周王朝)의 가족제가 붕괴되어 일족에게 수호되어 오던 농민과 경지를 영주가 확보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신흥 지주계층에게 권력을 빼앗겨 가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시대는 실력 본위의 자유로운 활력이 넘치는 유능한 인재의 발흥을 촉구하였다. 우리가 산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의 수립에 골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중국 역시도 씨족 공동체적 질서에 기반한 주의 봉건제도와 예문화가 중심적 지위를 상실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치열한 탐색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거기에 저마다 통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각국 군주 간의 경쟁은 사상의 발달을 더욱 촉진하였다. 이때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펼쳤던 수많은 학자(제자諸子)와 학파(백가百家)를 총칭해 ‘제자백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대(漢代) 이후의 제자백가는 유가·묵가·법가·도가·명가·병가·종횡가·농가·음양가·잡가 등으로 분류하며,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는 사회 정치사상만이 아니라 지리나 농업, 문학 등의 학술 활동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자(孔子)의 유가가 가장 먼저 일어나 인(仁)의 교의를 수립하였고, 그 다음으로 묵적(墨翟:墨子)이 겸애(兼愛)를 주창하여 묵가를 일으켰으며, 이윽고 노자(老子: 실존 여부에 이론이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성인(聖人) 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장자(莊子)를 위시한 도가와 기타 제파가 나타나 사상계는 제자백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두산백과』) 이때 공자에 의해 씌여진 것이 『논어』이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논어』를 읽어야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공자가 살던 시대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여물지 않았을 때 하나의 이론이나 가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만큼 삶의 다양성과 다른 이들과의 여러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확고한 하나의 교조를 선택하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한다. 강한 교조를 선택하면 자신이 강해지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그것은 자신의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 버리는 것이니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대(漢代) 이후의 제자백가는 유가·묵가·법가·도가·명가·병가·종횡가·농가·음양가·잡가 등으로 분류하며,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는 사회 정치사상만이 아니라 지리나 농업, 문학 등의 학술 활동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자(孔子)의 유가가 가장 먼저 일어나 인(仁)의 교의를 수립하였고, 그 다음으로 묵적(墨翟:墨子)이 겸애(兼愛)를 주창하여 묵가를 일으켰으며, 이윽고 노자(老子: 실존 여부에 이론이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성인(聖人) 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장자(莊子)를 위시한 도가와 기타 제파가 나타나 사상계는 제자백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두산백과』) 이때 공자에 의해 씌여진 것이 『논어』이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논어』를 읽어야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공자가 살던 시대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여물지 않았을 때 하나의 이론이나 가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만큼 삶의 다양성과 다른 이들과의 여러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확고한 하나의 교조를 선택하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한다. 강한 교조를 선택하면 자신이 강해지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그것은 자신의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 버리는 것이니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새로운 눈으로 읽어라
『논어』는 어려운 문장이나 내용이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 강목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을 캐고 들어갈수록 심오하고 놀라운 사상적 다양성,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느낄 수 있다. 『논어』의 시작은 「학이편」이다. 첫 세 대목을 함께 읽고 삶에 대해 생각해 보자.
『논어』는 어려운 문장이나 내용이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 강목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을 캐고 들어갈수록 심오하고 놀라운 사상적 다양성,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느낄 수 있다. 『논어』의 시작은 「학이편」이다. 첫 세 대목을 함께 읽고 삶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첫 대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여기서 우리는 대개 ‘시습(時習)’에 관한 논쟁을 만나게 된다. “때때로 익히다.”인지, “언제나 실천한다.” 인지에 따라 배움의 의미와 무게가 달라진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또한(亦)’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단순한 부사쯤으로만 여기고 그 부사가 문장 구조 어디에 어떻게 걸리는지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는다. ‘또한’이라는 것은 어디에 걸리는가? ‘익힌다/실천한다’가 기쁜 일이다. ‘또한’은 거기에 걸린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즐거워야 ‘또한’ 즐거운 것일까. 여기서는 배움이 기쁘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배움은 왜 기쁜 일인가? ‘학’이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불필요한 낭비 없이 해법을 얻을 수 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배움의 기쁨이란 그런 효용성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앎에서 오는 기쁨이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당연히 기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 ‘또한’ 기쁘다. 배우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그것을 익히고 따른다는 것이 기쁠 수는 없다.
이 물음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춰 보자. 과연 배움이 기쁜가? 학교에서의 배움과 가르침은 그 기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점수를 위한 공부, 성공을 위한 학습, 백점을 향해 무한 반복해야만 하는 공부, 묻고 캐고 따지며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교육이 아닌 공부가 즐거울 수 없다. 그런데도 심지어 『논어』조차 점수를 위한 공부나 주입식 교육으로 때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논어』의 이 첫 대목은 지금 우리에게 교육의 가치와 방법, 그리고 태도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셈이다. 그것은 바로 교육철학의 바탕이기도 하고 삶의 기본적 태도에 대한 성찰이 기도 하다.
배움은 왜 기쁜 일인가? ‘학’이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불필요한 낭비 없이 해법을 얻을 수 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배움의 기쁨이란 그런 효용성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앎에서 오는 기쁨이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당연히 기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 ‘또한’ 기쁘다. 배우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그것을 익히고 따른다는 것이 기쁠 수는 없다.
이 물음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춰 보자. 과연 배움이 기쁜가? 학교에서의 배움과 가르침은 그 기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점수를 위한 공부, 성공을 위한 학습, 백점을 향해 무한 반복해야만 하는 공부, 묻고 캐고 따지며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교육이 아닌 공부가 즐거울 수 없다. 그런데도 심지어 『논어』조차 점수를 위한 공부나 주입식 교육으로 때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논어』의 이 첫 대목은 지금 우리에게 교육의 가치와 방법, 그리고 태도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셈이다. 그것은 바로 교육철학의 바탕이기도 하고 삶의 기본적 태도에 대한 성찰이 기도 하다.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구절을 보자.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무턱대고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를 볼 게 아니다. 당대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고전을 공부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당시의 시간과 공간, 사건의 기본적 배경을 짚어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고 나서 현재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자가 살았던 당시의 ‘먼 곳’은 2~3일쯤 걸리는 곳일 게다. 그런데 멀리 사는 그 벗이 왜 찾아왔을까? 부탁이나 이해관계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런 사이를 벗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저 보고 싶어서’, ‘벗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그리움을 나눌 우정의 실체부터 살펴야 한다. 그게 먼저다. 그냥 먼 데서 온 벗을 강조할 게 아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더 즐거운가? 찾아온 벗인가, 그를 맞는 벗인가? 이 구절 자체로는 찾아온 벗을 맞는 친구의 즐거움만이 나타난다. 그의 즐거움은 친구의 출현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찾아간 벗은 어떤가?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청도에서 감 농사를 짓는다고 해보자. 흔히 ‘과수원’이라고 하면 낭만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주 힘든 농사이다. 어떤 이는 벼농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고 한다. 힘든 감 농사로 지쳤을 때 갑자기 옛 친구가 생각이 났다. 그 친구는 감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감을 따 보내고 싶어졌다. 그 순간 감 따는 건 고되고 지겨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노동이 된다. 가장 좋은 감을 골라서 따고 가지런히 바구니에 담으면서 이미 행복하다. 그리고 그 감 바구니를 들고 멀리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는 길은 또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러니 찾아온 벗을 맞는 이보다 벗을 찾아가는 이가 몇 배 더 크고 훨씬 더 길게 행복하다.
그리움의 행복이 큰 사람이 길을 나선다. 그러니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찾아가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보고 싶고 그리워 일부러 시간을 내고 힘들게 먼 길을 나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기쁨은 더 커지고 설렘도 짙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벗을 맞는 친구의 관점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바꿔 보면 내용도 달라진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구절을 보자.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무턱대고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를 볼 게 아니다. 당대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고전을 공부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당시의 시간과 공간, 사건의 기본적 배경을 짚어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고 나서 현재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자가 살았던 당시의 ‘먼 곳’은 2~3일쯤 걸리는 곳일 게다. 그런데 멀리 사는 그 벗이 왜 찾아왔을까? 부탁이나 이해관계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런 사이를 벗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저 보고 싶어서’, ‘벗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그리움을 나눌 우정의 실체부터 살펴야 한다. 그게 먼저다. 그냥 먼 데서 온 벗을 강조할 게 아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더 즐거운가? 찾아온 벗인가, 그를 맞는 벗인가? 이 구절 자체로는 찾아온 벗을 맞는 친구의 즐거움만이 나타난다. 그의 즐거움은 친구의 출현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찾아간 벗은 어떤가?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청도에서 감 농사를 짓는다고 해보자. 흔히 ‘과수원’이라고 하면 낭만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주 힘든 농사이다. 어떤 이는 벼농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고 한다. 힘든 감 농사로 지쳤을 때 갑자기 옛 친구가 생각이 났다. 그 친구는 감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감을 따 보내고 싶어졌다. 그 순간 감 따는 건 고되고 지겨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노동이 된다. 가장 좋은 감을 골라서 따고 가지런히 바구니에 담으면서 이미 행복하다. 그리고 그 감 바구니를 들고 멀리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는 길은 또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러니 찾아온 벗을 맞는 이보다 벗을 찾아가는 이가 몇 배 더 크고 훨씬 더 길게 행복하다.
그리움의 행복이 큰 사람이 길을 나선다. 그러니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찾아가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보고 싶고 그리워 일부러 시간을 내고 힘들게 먼 길을 나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기쁨은 더 커지고 설렘도 짙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벗을 맞는 친구의 관점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바꿔 보면 내용도 달라진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세 번째 행을 짚어 보자.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논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군자다. 그런데 군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라니! 하지만 그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일까? 누구나 남이 나의 잘난 모습을 알아주길 바란다. 겉으로야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그런 바람을 갖는다. 그런데 남이 알아주건 말건 자신의 일만 묵묵하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곧 군자라고 하니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수행이다. 사실 이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골내고 다른 이를 시샘하는 소인배의 삶을 경계하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수행과 실천을 거듭 강조한다. 그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핏 군자의 자격이나 정도가 쉽게 따를 수 없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공자는 어깨 힘 다 빼고 그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강조한다. 그 첫 언급이 바로 「학이편」 처음의 세 번째 행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며 격려하고 상기시키는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힘으로 다스리려 하기보다 덕과 의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믿음과 충성을 얻는다. 고대 사상이란 게 본디 지배 계층의 합리화 또는 정당화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설령 거기에서 출발했다 해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위대한 스승이고, 구루(Guru)다. 공자의 군자는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 뭐 대단한 거대담론이란 뜻도 아니다. 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고의 방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하고 일반적인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생활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학교는 올바른 정치적 능력을 함양하고 수행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논어』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다양한 정신적 가치와 풍부한 학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제후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그런 군자가 되는 날,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논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군자다. 그런데 군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라니! 하지만 그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일까? 누구나 남이 나의 잘난 모습을 알아주길 바란다. 겉으로야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그런 바람을 갖는다. 그런데 남이 알아주건 말건 자신의 일만 묵묵하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곧 군자라고 하니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수행이다. 사실 이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골내고 다른 이를 시샘하는 소인배의 삶을 경계하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수행과 실천을 거듭 강조한다. 그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핏 군자의 자격이나 정도가 쉽게 따를 수 없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공자는 어깨 힘 다 빼고 그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강조한다. 그 첫 언급이 바로 「학이편」 처음의 세 번째 행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며 격려하고 상기시키는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힘으로 다스리려 하기보다 덕과 의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믿음과 충성을 얻는다. 고대 사상이란 게 본디 지배 계층의 합리화 또는 정당화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설령 거기에서 출발했다 해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위대한 스승이고, 구루(Guru)다. 공자의 군자는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 뭐 대단한 거대담론이란 뜻도 아니다. 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고의 방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하고 일반적인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생활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학교는 올바른 정치적 능력을 함양하고 수행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논어』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다양한 정신적 가치와 풍부한 학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제후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그런 군자가 되는 날,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열린 눈으로 찾는 『논어』의 매력
『논어』는 얼핏 보면 그저 그런 도덕적 이야기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들의 이야기로 여겨지기 쉽다. 실제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책을 훑어 읽고서는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공자의 인품과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핵심적 면모를 정확히 간파했다. 야스퍼스는 공자사상의 합리적, 실용적인 면모와 함께 그의 인생에 대한 경건한 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과 질서와 진실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공자의 열렬한 소망을 지적하면서, “공자의 삶의 원동력은 권력욕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체가 되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논어』는 읽는 이의 태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대할 때 비유와 은유 등의 문학적 힘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며 읽어야 한다. 우리는 성리학적 해석 하나만을 고수하고 집착해 오지 않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한다. 주석서들은 지나치게 중복해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어떤 뜻을 캐내려는 점에서 ‘해설’의 병폐를 안고 있다. 『논어』는 공자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의도나 행위, 활동, 그가 겪은 희로애락이 모두 보통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틈틈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일상생활과 현실세계에 대해 제시한 각종 의견, 평론, 주장, 관점이다. 그것은 구체적이지 뜬구름 잡기가 아니며, 일반적이지 신비한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논어』라는 무게감에 눌려서 괜히 기죽거나 외면할 까닭이 없다. 『논어』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참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면 도리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주장, 의견 등등이 매우 높은 이상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도리가 높고 깊지만 말이 평이하고 기록한 내용도 평이한 『논어』의 진짜 매력은 열린 눈으로 읽어 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