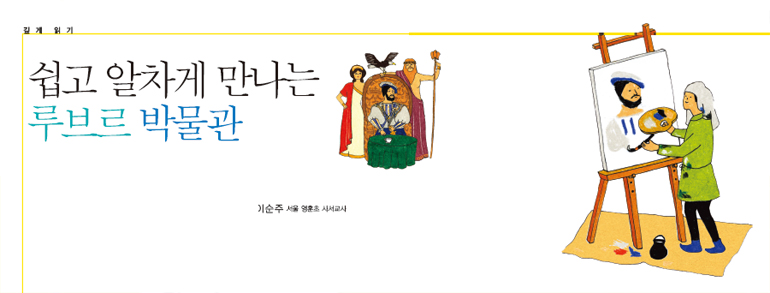어린이 새책 쉽고 알차게 만나는 루브르 박물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엄마, 책 읽어? 나도 같이 읽어… … 근데 루브르가 뭐야?”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루브르 박물관’ 책을 읽으려고 펼쳐
들자마자 1학년 딸내미가 쪼르르 달려와 내 얼굴 옆에 턱을 받치고 묻는다. “어? 응? 으응… ….” 평소에는 하루하루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선 절대 책을 펼쳐들지 않는 엄마가 웬일로 책을 펼치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나보다. “음… … 루브르는 말이지, 프랑스라는 나라에 있는 커다란 박물관이야.” “응? 박물관? 박물관이 뭔데?” “박물관은 말이지, 유명하고 멋있는 미술 작품들을 모아놓은 집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프랑스는 어디에 있는 나라야?” 이쯤 되면 8살이나 된 딸내미에게 예술문화적인 측면, 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 방임을 자처한 엄마임을 고백하는 셈이 된다.
미술관이나 음악회 같은 곳은 좀 더 크면 데리고 다니면 되겠지.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애들 좋아하는 그림책이나 겨우 읽어 주고, 어린이 뮤지컬이나 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 했던 엄마의 무심함을 탓하게 된다. 그런 착잡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루브르 박물관’의 첫 느낌은 “아~ 쉽다!”였다. 이 책의 지은이인 동화작가 조성자 선생님을 따라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걷다보면 리슐리외관, 쉴리관, 드농관의 많은 salle를 구석구석 누빈다는 느낌이 든다.
루브르에서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는 82점의 그림과 조각품, 유물들을 골고루 선정해 어느 한 시대나 한 분야에 치우지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쉽게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도록, 또 박물관이라는 곳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각 예술품마다 캐릭터를 설정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성자 선생님과 늘 함께 여행했던 ‘녹색운동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필기할 때 항상 함께 했던 보라색 볼펜 ‘보라둥이’, 박물관의 구석구석 돌아다녀서 여러 작품에 대해모르는 것이 없는 ‘파리 바람’ 등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군뿐만 아니라 각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무 그루터기, 모자, 반지, 복슬 강아지, 말 등의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각 작품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미술 상식, 예를 들면 초상화, 원근법, 단축법, 스푸마토 같은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작품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역사상식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이유와 미라를 만드는 과정, 투탕카멘의 저주, 유럽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메디치가의 이야기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만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작품 하나를 보아도 꼭 정면 모습뿐만 아니라 옆면, 뒷면에서의 다양한 구도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일깨워주는 장면이었다.
예술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싣고 있어 직접 루브르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들었다. 출판사 편집자가 작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에 대해 물었을 때 작가가 말했던 ‘절름발이 소년’과 ‘거지 소년’이라는 작품이 내게도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왔고, 그들이 가장 많은 신경이 쓰였던 존재들이라서 그랬나보다. 루브르 박물관엔 다른 곳은 거의 텅텅 비어있고, 모나리자 앞에만 사람이 바글거린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다. 인류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고인 루브르 박물관을 충분히 보고, 느끼고, 공부하고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닌 패키지여행으로 유럽 8개국에 점만 찍고 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여행은 너무 소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며, 앞으로 ‘루브르 개년 계획’을 세워 그 동안 몸도 마음도 부쩍 자라있을 딸내미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한 번 다녀와야겠다고 다짐하며 이 책을 덮는다. 물론 조성자 선생님의 루브르 박물관 책과 함께 말이다.

들자마자 1학년 딸내미가 쪼르르 달려와 내 얼굴 옆에 턱을 받치고 묻는다. “어? 응? 으응… ….” 평소에는 하루하루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선 절대 책을 펼쳐들지 않는 엄마가 웬일로 책을 펼치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나보다. “음… … 루브르는 말이지, 프랑스라는 나라에 있는 커다란 박물관이야.” “응? 박물관? 박물관이 뭔데?” “박물관은 말이지, 유명하고 멋있는 미술 작품들을 모아놓은 집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프랑스는 어디에 있는 나라야?” 이쯤 되면 8살이나 된 딸내미에게 예술문화적인 측면, 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 방임을 자처한 엄마임을 고백하는 셈이 된다.
미술관이나 음악회 같은 곳은 좀 더 크면 데리고 다니면 되겠지.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애들 좋아하는 그림책이나 겨우 읽어 주고, 어린이 뮤지컬이나 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 했던 엄마의 무심함을 탓하게 된다. 그런 착잡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루브르 박물관’의 첫 느낌은 “아~ 쉽다!”였다. 이 책의 지은이인 동화작가 조성자 선생님을 따라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걷다보면 리슐리외관, 쉴리관, 드농관의 많은 salle를 구석구석 누빈다는 느낌이 든다.
루브르에서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는 82점의 그림과 조각품, 유물들을 골고루 선정해 어느 한 시대나 한 분야에 치우지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쉽게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도록, 또 박물관이라는 곳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각 예술품마다 캐릭터를 설정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성자 선생님과 늘 함께 여행했던 ‘녹색운동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필기할 때 항상 함께 했던 보라색 볼펜 ‘보라둥이’, 박물관의 구석구석 돌아다녀서 여러 작품에 대해모르는 것이 없는 ‘파리 바람’ 등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군뿐만 아니라 각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무 그루터기, 모자, 반지, 복슬 강아지, 말 등의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각 작품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미술 상식, 예를 들면 초상화, 원근법, 단축법, 스푸마토 같은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작품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역사상식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이유와 미라를 만드는 과정, 투탕카멘의 저주, 유럽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메디치가의 이야기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만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작품 하나를 보아도 꼭 정면 모습뿐만 아니라 옆면, 뒷면에서의 다양한 구도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일깨워주는 장면이었다.
예술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싣고 있어 직접 루브르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들었다. 출판사 편집자가 작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에 대해 물었을 때 작가가 말했던 ‘절름발이 소년’과 ‘거지 소년’이라는 작품이 내게도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왔고, 그들이 가장 많은 신경이 쓰였던 존재들이라서 그랬나보다. 루브르 박물관엔 다른 곳은 거의 텅텅 비어있고, 모나리자 앞에만 사람이 바글거린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다. 인류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고인 루브르 박물관을 충분히 보고, 느끼고, 공부하고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닌 패키지여행으로 유럽 8개국에 점만 찍고 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여행은 너무 소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며, 앞으로 ‘루브르 개년 계획’을 세워 그 동안 몸도 마음도 부쩍 자라있을 딸내미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한 번 다녀와야겠다고 다짐하며 이 책을 덮는다. 물론 조성자 선생님의 루브르 박물관 책과 함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