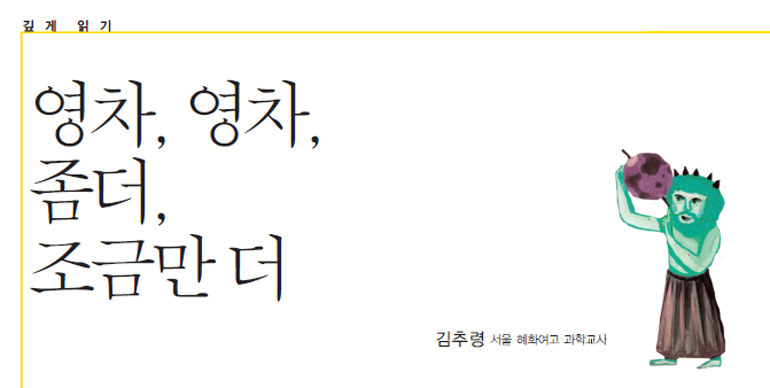어린이 새책 영차, 영차, 좀더, 조금만 더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이 책을 덮으면서 고민이 생겼다. 두 가지 느낌이 동시에 들이 닥쳤기 때문이다. 참 좋다. 그런데 아쉽다. 아쉬운 부분에 대한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책을 평가절하하려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학 글쓰기의 어려움을 먼저 토로해보려고 한다. (내가 쫀쫀한 서평가라는 혐의를 피해 보려고?)
과학책들은 어렵게 느끼는 과학이론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해설을 강행한다. 이 책에서도 마그마의 분출을, 계란을 삶을 때 겉껍질이 깨지고 그 사이로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과정에 비유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비유를 위해 과학책들은 때론 과감하게 적확성을 일부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학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할 점이 오개념이다. 과학은 정확성을 요하는 만큼 오개념도 많은 영역이다. 사람들은 인식의 과정에서 감각 수용기를 통한 경험으로 먼저 자연과 세계와 현실을 수용한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세계를 과학이론으로 재해석한다. 그러다 보니 수용단계의 시간차가 오개념을 굳히게 한다. 특히 아동의 경우 과학이론에 접하는 첫 경험의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그러므로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관련 글은 더 이러한 오개념의 형성에 주의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비유를 선택하되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절대 어려워서는 안된다!’ 이러니 과학글쓰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과학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삽화의 문제이다. 삽화를 그리는 분들은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다. 또 삽화는 교과서의 도해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우면서 재미도 주어야 하는 과학 삽화의 경우 실수가 종종 생긴다. 내가 아는 과학책 저자는 삽화가와 여러번 교정을 오가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정확한 의미 전달의 그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 글쓰기는 어렵다. 이 책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흔적이 보인다. 강수이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얼음(빙정)이 위로 오르락내리락해서 커지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실은 포화수증기압의 차이에 의해 얼음이 커진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 스에서 신화의 오류를 지적하며, 지구복사에너지에 의해 고도에 따른 온도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햇볕은 대기를 그냥 지나치기만 한다고 서술한 부분(실은 대기도 20%정도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한다), 아틀라스가 지구를 들고 있는삽화에서 페르세우스가 “암석 껍데기라 무겁긴 하겠다”고 한말풍선에 있는 글은 지구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분이 지각인 것같은 오해를 일으킨다(실은 지구 내부의 맨틀, 핵의 밀도가 훨씬 더 크고 부피도 더 크다).
또 지하세계의 페르세포네에서 식물이 싹트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설계가 등장하는데, 이때 조작변인으로 온도와 물을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한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온도 변인을 햇빛으로 설정하여 햇빛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온도가 높다는 것과 햇빛이 비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조건이며, 식물은 햇빛 없이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면 싹을 틔운다. 탐구 설계의 예를 잘 제시했는데 아쉽다.
그럼에도 이 책은 참 훌륭한 책이다. 아이들의 욕구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신화에 열광한다. 그것은 만화를 좋아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일 것이다. 만화와 신화는 무한 상상의 세계이다.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의 금기를 깨버리는 상상력의 폭발인 것이다. 신화는 상상력의 세계이고 과학은 치밀함과 논리 속에서 탄생한 세계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해석의 양단을 묶어냈다. 신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과학적 사고방법에 연유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리고 신화시대의 사람들은 그 “왜?”의 해답을 신화로 해석해 내었다.
상상력과 과학의 세계를 넘나들며 이 책은 참으로 많은 과학적 주제들을 섭렵하고 있다. 지각의 변동, 지표의 변화, 태양계, 생물, 빛과 파동, 화학 등 넓은 부분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책이다. 또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학생들이 과학교과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3장 지구의 자전과 별의 일주 운동, 4장 태양이 지나는 길, 황도, 5장 계절의 변화와 별자리, 7장 소리와 소리의 반사, 8장 거울과 물체의 상의 주제들이다.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다. 술렁술렁 읽지 말고 꼼꼼쟁이처럼 읽어내라고. 한번만 읽지 말고 꼭두 번을 읽으라고. 한편 저자에게도 또 다른 아쉬움도 있다. 태양계의 내용 가운데에서 조금만 더 지면을 할애하거나 삽화에 좀 더 친절함을 기했더라면 독자들의 책읽기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과학책들은 어렵게 느끼는 과학이론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해설을 강행한다. 이 책에서도 마그마의 분출을, 계란을 삶을 때 겉껍질이 깨지고 그 사이로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과정에 비유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비유를 위해 과학책들은 때론 과감하게 적확성을 일부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학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할 점이 오개념이다. 과학은 정확성을 요하는 만큼 오개념도 많은 영역이다. 사람들은 인식의 과정에서 감각 수용기를 통한 경험으로 먼저 자연과 세계와 현실을 수용한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세계를 과학이론으로 재해석한다. 그러다 보니 수용단계의 시간차가 오개념을 굳히게 한다. 특히 아동의 경우 과학이론에 접하는 첫 경험의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그러므로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관련 글은 더 이러한 오개념의 형성에 주의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비유를 선택하되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절대 어려워서는 안된다!’ 이러니 과학글쓰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과학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삽화의 문제이다. 삽화를 그리는 분들은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다. 또 삽화는 교과서의 도해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우면서 재미도 주어야 하는 과학 삽화의 경우 실수가 종종 생긴다. 내가 아는 과학책 저자는 삽화가와 여러번 교정을 오가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정확한 의미 전달의 그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 글쓰기는 어렵다. 이 책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흔적이 보인다. 강수이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얼음(빙정)이 위로 오르락내리락해서 커지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실은 포화수증기압의 차이에 의해 얼음이 커진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 스에서 신화의 오류를 지적하며, 지구복사에너지에 의해 고도에 따른 온도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햇볕은 대기를 그냥 지나치기만 한다고 서술한 부분(실은 대기도 20%정도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한다), 아틀라스가 지구를 들고 있는삽화에서 페르세우스가 “암석 껍데기라 무겁긴 하겠다”고 한말풍선에 있는 글은 지구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분이 지각인 것같은 오해를 일으킨다(실은 지구 내부의 맨틀, 핵의 밀도가 훨씬 더 크고 부피도 더 크다).
또 지하세계의 페르세포네에서 식물이 싹트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설계가 등장하는데, 이때 조작변인으로 온도와 물을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한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온도 변인을 햇빛으로 설정하여 햇빛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온도가 높다는 것과 햇빛이 비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조건이며, 식물은 햇빛 없이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면 싹을 틔운다. 탐구 설계의 예를 잘 제시했는데 아쉽다.
그럼에도 이 책은 참 훌륭한 책이다. 아이들의 욕구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신화에 열광한다. 그것은 만화를 좋아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일 것이다. 만화와 신화는 무한 상상의 세계이다.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의 금기를 깨버리는 상상력의 폭발인 것이다. 신화는 상상력의 세계이고 과학은 치밀함과 논리 속에서 탄생한 세계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해석의 양단을 묶어냈다. 신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과학적 사고방법에 연유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리고 신화시대의 사람들은 그 “왜?”의 해답을 신화로 해석해 내었다.
상상력과 과학의 세계를 넘나들며 이 책은 참으로 많은 과학적 주제들을 섭렵하고 있다. 지각의 변동, 지표의 변화, 태양계, 생물, 빛과 파동, 화학 등 넓은 부분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책이다. 또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학생들이 과학교과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3장 지구의 자전과 별의 일주 운동, 4장 태양이 지나는 길, 황도, 5장 계절의 변화와 별자리, 7장 소리와 소리의 반사, 8장 거울과 물체의 상의 주제들이다.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다. 술렁술렁 읽지 말고 꼼꼼쟁이처럼 읽어내라고. 한번만 읽지 말고 꼭두 번을 읽으라고. 한편 저자에게도 또 다른 아쉬움도 있다. 태양계의 내용 가운데에서 조금만 더 지면을 할애하거나 삽화에 좀 더 친절함을 기했더라면 독자들의 책읽기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