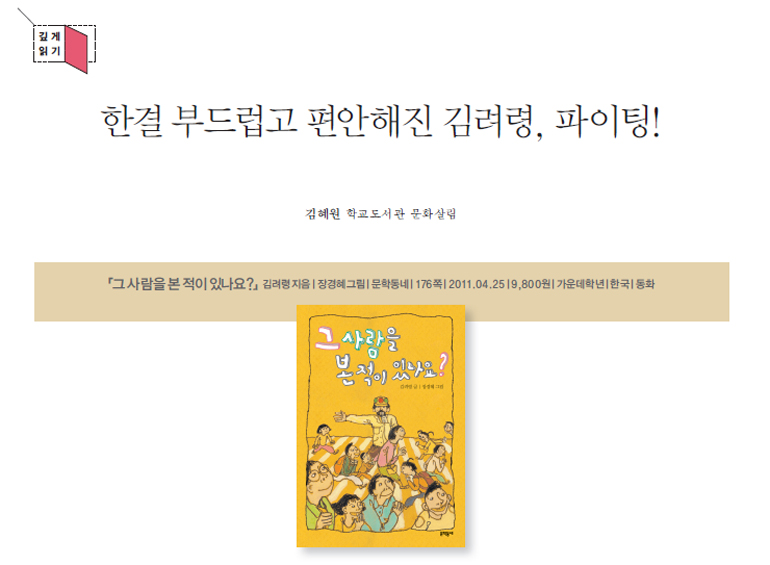어린이 새책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진 김려령, 파이팅!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오랜만에 김려령이 동화를 발표했다. 전작들에 비해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 부드러움은 작가의 편안함에 원인이 있다. 김려령은 책 곳곳에서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독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에 박힌 ‘꽁꽁 숨겨둔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했다. 작가 본인이 틀림없어 보이는 이야기 속 인물에,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경계가 모호한 이야기의 진행에 비추어 보면, 이 동화는 작가의 어린 시절이 일정 부분 투영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작가의 가슴속 응어리는 ‘엄마’다. 김려령 작품에서 엄마는 집 밖에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앞에서 ‘땡깡 부릴 수 있는’ 존재인 엄마는, 감려령의 작품에는 없다.
예의를 차려야 하거나(『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찾아 나서야 하거나(『완득이』), 부재중(『기억을 가져온 아이』)이다. 작가는 이런 엄마를 마음에 가지게 된 기억을 이 작품에서 풀어내고 있다. ‘나를 버린 엄마’ 그리고 ‘나를 버렸던 엄마’. 김려령은 이 작품에서 이 엄마와의 화해를 시도했고, 어느 정도 한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한풀이 하는 과정 사이사이에 작가의 생목소리가 지나치게 보여서 읽는 이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김려령은 한결 편안해졌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느꼈을 때, 내 손을 잡고 덜 힘들게 삶을 건네준 ‘건널목씨’를 그런 편안함으로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이야기는 작가가 어린 시절 만난 건널목씨에 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그 건널목씨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작가 오명랑’의 ‘이야기 들려주기 교실’ 풍경이 중첩되어 있다.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면, 손잡고 그 상황을 함께 견뎌내 주는 ‘건널목씨’라는 캐릭터는 동화라는 장르에 참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건널목이라는 상징은 아주 작게 골목길의 건널목에서부터 크게는 삶의 시기, 시기마다를 연결해 주는 성장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선명한 상징이 건널목씨를 확실한 캐릭터로 자리 잡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야기 들려주기’라는 작업도 이런 건널목 상징의 다른 표상일 수 있다. 책과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 건널목 말이다. 세상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등으로 모든 것을 경계 짓고 양분하려 한다. 이런 시대에 건널목씨라는 상징적 캐릭터의 등장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김려령은 일정한 가독성을 담보하는 작가다. 이런 작가라는 것을 전제하면 이 동화는 몇몇 아쉬움이 눈에 띈다. 우선, 작가의 회고담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를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작가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작가의 어린 시절을 쓰는 동화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그 작가가 현실에 대한 확고한 세계관이 없을 경우, ‘그땐 그랬지’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회고담을 쓰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어린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 빌려오는 것이어야 한다. ‘작가가 아는 것을 쓰라’는 주문은, 아는 것 안에서 쓰라는 것이기보다, 좀 더 아는 것의 범위를 넓히라는, 그래서 세상에 관해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김려령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는 그리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또 하나 아쉬움은 동화에 아이들이 없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동화를 읽을 때는 등장인물 중 누군가에게 마음을 실어서 읽는다. 이 동화를 읽을 때 아이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실을까? 건널목씨? 오명랑 작가? 도희? 누구도 썩 내키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변방에 있다.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거나 건널목씨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궁금하다. 건널목씨가 길을 건네주는 대상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왜 아무도 목소리가 없는 걸까? 건널목씨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른들뿐이다. 심지어 상급생의 폭행에서 구해준 쌍둥이 형제들도 고맙다는 인사는 아버지가 한다.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정서는 따뜻함인데 그 따뜻함은 어른들끼리만 나누는 감정이 되어버렸다. 어른이 읽어서 따뜻한 동화라고 변호할 수 있다. 하지만 동화의 일차 독자는 아이들이어야 한다. 이 동화가 일차 소비자인 어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다.
우리는 『완득이』의 속도감을 기억한다. 되짚어보면 허점이 있더라도 치고나가는 힘이 있었다. 그런 힘은 김려령의 소중한 능력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 힘이 현저히 빠졌다. 설명하고, 확인하고, 의미 부여를 한다. 아이들은 그렇게 책을 읽지 않는다. 재미있게 주인공을 따라갈 뿐이다. 작가의 편안함이 노파심을 동반하게 된 건 아닐까.
김려령은 이 시대 주목받는 동화작가다. 그 작가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몫은 독자의 것이다. 그 변화가 진화이길 기대한다. 아름다운 진화를 기다린다.

예의를 차려야 하거나(『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찾아 나서야 하거나(『완득이』), 부재중(『기억을 가져온 아이』)이다. 작가는 이런 엄마를 마음에 가지게 된 기억을 이 작품에서 풀어내고 있다. ‘나를 버린 엄마’ 그리고 ‘나를 버렸던 엄마’. 김려령은 이 작품에서 이 엄마와의 화해를 시도했고, 어느 정도 한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한풀이 하는 과정 사이사이에 작가의 생목소리가 지나치게 보여서 읽는 이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김려령은 한결 편안해졌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느꼈을 때, 내 손을 잡고 덜 힘들게 삶을 건네준 ‘건널목씨’를 그런 편안함으로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이야기는 작가가 어린 시절 만난 건널목씨에 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그 건널목씨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작가 오명랑’의 ‘이야기 들려주기 교실’ 풍경이 중첩되어 있다.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면, 손잡고 그 상황을 함께 견뎌내 주는 ‘건널목씨’라는 캐릭터는 동화라는 장르에 참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건널목이라는 상징은 아주 작게 골목길의 건널목에서부터 크게는 삶의 시기, 시기마다를 연결해 주는 성장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선명한 상징이 건널목씨를 확실한 캐릭터로 자리 잡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야기 들려주기’라는 작업도 이런 건널목 상징의 다른 표상일 수 있다. 책과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 건널목 말이다. 세상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등으로 모든 것을 경계 짓고 양분하려 한다. 이런 시대에 건널목씨라는 상징적 캐릭터의 등장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김려령은 일정한 가독성을 담보하는 작가다. 이런 작가라는 것을 전제하면 이 동화는 몇몇 아쉬움이 눈에 띈다. 우선, 작가의 회고담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를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작가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작가의 어린 시절을 쓰는 동화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그 작가가 현실에 대한 확고한 세계관이 없을 경우, ‘그땐 그랬지’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회고담을 쓰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어린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 빌려오는 것이어야 한다. ‘작가가 아는 것을 쓰라’는 주문은, 아는 것 안에서 쓰라는 것이기보다, 좀 더 아는 것의 범위를 넓히라는, 그래서 세상에 관해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김려령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는 그리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또 하나 아쉬움은 동화에 아이들이 없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동화를 읽을 때는 등장인물 중 누군가에게 마음을 실어서 읽는다. 이 동화를 읽을 때 아이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실을까? 건널목씨? 오명랑 작가? 도희? 누구도 썩 내키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변방에 있다.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거나 건널목씨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궁금하다. 건널목씨가 길을 건네주는 대상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왜 아무도 목소리가 없는 걸까? 건널목씨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른들뿐이다. 심지어 상급생의 폭행에서 구해준 쌍둥이 형제들도 고맙다는 인사는 아버지가 한다.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정서는 따뜻함인데 그 따뜻함은 어른들끼리만 나누는 감정이 되어버렸다. 어른이 읽어서 따뜻한 동화라고 변호할 수 있다. 하지만 동화의 일차 독자는 아이들이어야 한다. 이 동화가 일차 소비자인 어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다.
우리는 『완득이』의 속도감을 기억한다. 되짚어보면 허점이 있더라도 치고나가는 힘이 있었다. 그런 힘은 김려령의 소중한 능력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 힘이 현저히 빠졌다. 설명하고, 확인하고, 의미 부여를 한다. 아이들은 그렇게 책을 읽지 않는다. 재미있게 주인공을 따라갈 뿐이다. 작가의 편안함이 노파심을 동반하게 된 건 아닐까.
김려령은 이 시대 주목받는 동화작가다. 그 작가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몫은 독자의 것이다. 그 변화가 진화이길 기대한다. 아름다운 진화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