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새책 독설과 위트가 묻어나는 실전형 영화교과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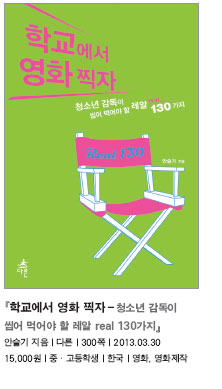 실전형 예술교과서를 지향한다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시리즈가 이번에는 공립학교 수학교사인 안슬기 선생님의 글로 청소년 영화 제작의 길을 보여준다. 한겨레 영화학교를 거쳐 <다섯은 너무 많아>, <나의 노래는>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세 편의 극장용 영화를 선보인 인디감독이라는 필모그래피가 필자로서의 강점과 신뢰성을 공고히 해줄 것이라는 기획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았으나, 책을 덮고 나니 성공적인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한 130가지 팁, 촘촘히 박혀있는 팁들의 모음이어서인지 목차에 페이지 수는 최소한으로 기록되었지만 색인을 찾지 않아도 쉽게 기억할 만한 구성을 취했다. ‘근데요, 쌤!’이라는 코너는 지식정보책에서 발견하는 정보페이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목차와 구성면에서 교과서 형태를 많이 닮았다.
실전형 예술교과서를 지향한다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시리즈가 이번에는 공립학교 수학교사인 안슬기 선생님의 글로 청소년 영화 제작의 길을 보여준다. 한겨레 영화학교를 거쳐 <다섯은 너무 많아>, <나의 노래는>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세 편의 극장용 영화를 선보인 인디감독이라는 필모그래피가 필자로서의 강점과 신뢰성을 공고히 해줄 것이라는 기획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았으나, 책을 덮고 나니 성공적인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한 130가지 팁, 촘촘히 박혀있는 팁들의 모음이어서인지 목차에 페이지 수는 최소한으로 기록되었지만 색인을 찾지 않아도 쉽게 기억할 만한 구성을 취했다. ‘근데요, 쌤!’이라는 코너는 지식정보책에서 발견하는 정보페이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목차와 구성면에서 교과서 형태를 많이 닮았다.차별성을 보이는 첫 번째 요소는 본문에서 구사하는 어조다. 다소 거칠게 밀어붙이는 듯하면서도 필요한 말을 빠뜨리고 있지 않았다. 가령 책제목은 학교에서 영화 찍자인데, 충고의 첫 단추가 “웬만하면 만들지 마라”다. 짐작보다 천 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영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더니 다음 내미는 팁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 그럼 스무 살 넘어서 만들라고 한다. 이 정도면 약오를 정도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 공감하며 다독이는 격려의 메시지 대신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겠다고 물어오니 슬슬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공들여 말린 뒤에 고려할 현실이 ‘돈’과 ‘사람’으로 제시된다.
청소년들의 언어유희 포인트를 잘 짚어낸 재치 있는 유머도 팁 형식의 단조로움을 상쇄시킨다. 메이킹 필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털주머니 마이크는 녹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쓰는 실외용 소품인데, 이러한 데드캣을 멋지게 폼 잡으며 실내에서 찍는 실수를 짚어준다. 개 주위에 레몬즙을 뿌리면 신기하게 짖지 않는데 사람이 짖으면 대책이 없다니 읽어보면 뼈있는 유머들도 자주 보인다. 요즘 많이 애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자신을 찍을 수 있는데, 다만 정방향보다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니 기억해야겠다.
실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충고들을 담아낸 부분이 많다. 영화를 만들려고 결심한 사람이 차근차근 밟아가야 할 과정과 그 단계에서 주의한 함정과 실수들이 빼곡히 담겨있다. 편집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앞뒤 컷의 연기까지 함께 담아내는 ‘더블액션’이 필요하다든지, 배우는 감독의 액션 사인 이후 3초를 센 뒤에 연기를 시작하고, 감독은 연기가 끝나고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컷 사인을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는 타임라인에 미리보기를 이용해 가편집한 것이므로 파일이름이나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초보적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게 한다.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보여준 팁들이다.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보여 줄 영화의 대본이기 때문에 소설적 표현이 아닌 시각적 표현을 써야한다는 것, 그리고 네버엔딩스토리가 되지 않으려면 중간에서 시작해서 서둘러 끝내라는 충고는 글쓰기 지도를 하는 교사로서도 흥미롭게 읽혔다. 리뷰는 될 수 있으면 A4 반 페이지 이상의 문서로 써달라고 할 것이며, 정성스러운 리뷰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소에 친구들에게 그런 리뷰를 해주라는 충고가 곁들어진다. 이미 짐작하는 사실도 “서랍도 시나리오를 쓴다.”라는 표현으로 들으니 신선하게 들린다.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인다는 3장 구조나 캐릭터를 구체화하기 위해 영화의 주인공을 놓고 질문에 대답해보기는 도드라지게 이론에 치우친 느낌이 들었다. 특히 후자를 실제 ‘나’를 주인공으로 설정해놓고 써 보아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 지나친 준비가 아닌가 싶었다. 서울방송고 학생이 그린 본문 그림은 콘티장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어 보이지만, 장비나 기타 세밀한 시각자료를 요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이러한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한 편의 영화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충고를 다시 되감아보면, 결국 영화는 혼자 만들 수 없는 것이며, 거듭 현실적인 고민들을 껴안아야 하는 종합예술임을 실감하게 된다. “영화의 이야기란, 누군가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한다며 지루한 일상을 강요하지 말라”는 대목에서 감독으로서가 아닌 선생님으로서의 나의 고민이 함께 겹쳐졌다. UCC 동영상대회에 친구들과 함께 만든 동영상을 제출하겠다며, 청소년 미디어센터에 다니는 아이에게 전할 좋은 선물이 생겼다.
